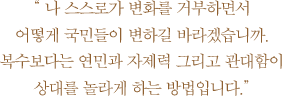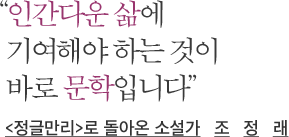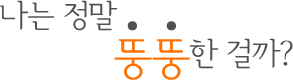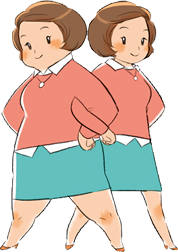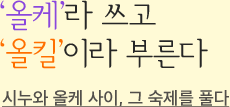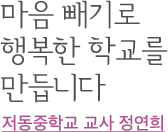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는 말띠 해 중에서도 가장 진취적이고 활달한 청말띠의 해다. 예로부터 “하늘을 다니기는 용과 같은 것이 없고, 땅을 다니기는 말과 같은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말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 말은 신성한 동물이자 하늘의 사신, 중요한 인물 탄생을 알려주는 영물로 알려져 있다. 천년 왕국이었던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말이 전해준 알에서 태어났고, 고구려 시조 주몽은 기린말을 타고 승천했다고 전해진다. ‘힘찬 질주, 강한 생동감’을 상징하며 인류의 벗으로서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는 말들. 그중 중국 리강 작가의 몽골말들을 소개한다. – 편집자주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인간과의 깊은 정서를 교감하고 있는 말은 오래전부터 농사, 사냥, 전쟁, 오락에 이용되면서 인간과 매우 독특한 동반 관계를 유지해왔다.
내가 찍은 말의 대다수는 중국 경내에 있는 것으로, 토종말, 몽골말, 이리말, 산단말, 삼하말 등이 있다. 이 사진들은 내몽골 오란포통에서 찍은 몽골말들로 대개가 마방에서 개량했다.
그곳은 위도가 높고 해발고도가 2,000미터에 달한다. 일 년의 절반은 눈에 덮여 있고, 겨울철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30도에 달하며 바람이 세게 분다. 몽골말은 대개 몸체가 크지 않고 달리는 속도도 그다지 빠르지 않지만,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뛰어나다.


겨울의 설경 속에서 뛰어노는 몽골의 야생마들을 보고 있노라면 생명의 신비감이 느껴진다. 겨울의 설원, 새하얀 벌판, 백지처럼 드문드문 떨어지는 백양나무 잎과 하늘 아래 연한 하늘색을 띤 그림자, 그리고 눈 위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말들…. 침착하고 조화로운 만리설경에서 말들은 자유롭게 경주한다. 달리고 또 달린다.
사진 & 글 리강 (李剛·Li Gang)


사진가 리강 님은 1948년 하남성 중국 신양 출생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말[馬]에 관심을 기울여왔고 수년간 끈질기게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면서 촬영해 왔습니다. 2009년 <馬>라는 작품으로 중국 촬영제에서 금상을 수상했으며, 대자연 속에서 무언가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분방한 말을 통해 말 사진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