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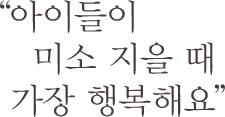
м·Ёмһ¬, мӮ¬м§„ л¬ём§„м •
충л¶Ғ мқҢм„ұмқҳ н•ңм Ғн•ң лҶҚмҙҢ л§Ҳмқ„м—җ мң лӮңнһҲ к°•м•„м§Җ мҶҢлҰ¬лЎң мӢңлҒҢлІ…м Ғн•ң 집мқҙ мһҲмҠөлӢҲлӢӨ. к·ёкіім—җлҠ” н‘ёлҘё лҲҲмқҳ мҠӨмң„мҠӨ н• лЁёлӢҲ л§Ҳк°Җл ӣ лӢқкІҹнҶ (67)м”Ёк°Җ мӮҙкі мһҲмҠөлӢҲлӢӨ. 30м—¬ л…„ м „ нҷҖлЎң н•ңкөӯмңјлЎң мҷҖ ліҙмңЎмӣҗ, кі м•„мӣҗ л“ұм—җм„ң лҙүмӮ¬н•ҳл©° нҸүмғқмқ„ ліҙлӮё к·ёл…ҖлҠ” мҳҒлқҪм—ҶлҠ” н‘ёк·јн•ң мӢңкіЁ н• лЁёлӢҲмһ…лӢҲлӢӨ. к·ёл…Җмқҳ н•ңкөӯ мқҙлҰ„мқҖ мқём§„мЈј.
мҠӨмң„мҠӨм—җм„ң нғңм–ҙлӮҳ м–ҙл Өмҡҙ к°Җм • нҷҳкІҪ л•Ңл¬ём—җ м–ҙлҰҙ м Ғл¶Җн„° мІӯмҶҢ, мҡ”лҰ¬, нғҒм•„мҶҢ мқјмқ„ н–ҲлҚҳ к·ёл…ҖлҠ” 1970л…„лҢҖ к°„нҳёмӮ¬к°Җ лҗҳм—Ҳкі лӢ№мӢң мң лҹҪмңјлЎң к°„ н•ңкөӯмқҳ к°„нҳёмӮ¬л“Өмқ„ л§ҢлӮҳкІҢ лҗ©лӢҲлӢӨ. к·ё мқём—°мңјлЎң лӘҮ м°ЁлЎҖ н•ңкөӯмқ„ л°©л¬ён•ҳкІҢ лҗҳл©ҙм„ң н•ңкөӯмқёл“Өмқҳ мӮ¶м—җ нҒ¬кІҢ к°җлҸҷмқ„ л°ӣкІҢ лҗҳм§Җмҡ”.
вҖңлӢЁм№ёл°©м—җ мӮҙм•„лҸ„ мқҙмӣғкіј л°Ҙ н•ң мҲҹк°ҖлқҪлҸ„ кјӯ лӮҳлҲ лЁ№лҚҳ лӘЁмҠөм—җ л§ҲмқҢмқҙ м°Ўн–Ҳм–ҙмҡ”. м–ҙл”ң к°ҖлӮҳ м„ңлЎң м•„к»ҙмЈјкі лӮҙ кІғ л„Ө кІғ кө¬л¶„мқҙ м—Ҷкі вҖҰ. м–ҙл–Ө л¶ҖмһҗліҙлӢӨлҸ„ н–үліөн•ҳлӢӨлҠ” мғқк°Ғмқҙ л“Өм—Ҳм§Җмҡ”.вҖқ
1985л…„, к·ёл…ҖлҠ” н•ңкөӯн–үмқ„ кІ°мӢ¬н–Ҳкі н•ңкөӯм—җ лҸ„м°©н•ҳмһҗл§Ҳмһҗ ліҙмңЎмӣҗ, мһҘм• мқё мӢңм„Өл“Өмқ„ м°ҫм•ҳмҠөлӢҲлӢӨ. к·ёлҰ¬кі 1993л…„л¶Җн„°лҠ” м „ м„ёкі„ м–ҙлҰ°мқҙл“Өмқ„ нӣ„мӣҗн•ҳкё° мӢңмһ‘н–ҲмҠөлӢҲлӢӨ.
мҲҳмһ…мқҙлқјкі лҠ” мҠӨмң„мҠӨм—җм„ң ліҙлӮҙмҳӨлҠ” 80л§Ң мӣҗ лӮЁм§“н•ң м—°кёҲмқҙ м „л¶ҖмҳҖм§Җл§Ң к·ё лҸҲмқ„ мһҗмӢ л§Ңмқ„ мң„н•ҙ м“°лҠ” кІғмқҖ к·ёл…Җм—җкІҢ нҒ° м§җмқҙм—ҲлҚҳ кІғмқҙм§Җмҡ”.
вҖң2001л…„м—җ л¬ҙлҰҺ мҲҳмҲ мқ„ н•ҳкІҢ лҗҳл©ҙм„ң лӘҮ к°ңмӣ”к°„ к°„нҳё лҙүмӮ¬лҸ„, нӣ„мӣҗлҸ„ лӘ»н•ң м Ғмқҙ мһҲм—Ҳм–ҙмҡ”. м• л“ӨмқҖ н•ҳлЈЁм—җ н•ң лҒјлҸ„ лӘ» лЁ№кі лі‘м—җ кұёлҰ¬л©ҙ мЈҪмқ„ мҲҳл°–м—җ м—ҶлҠ”лҚ°вҖҰ. лӮ мң„н•ҙм„ңл§Ң мӮ¬лҠ” кІҢ мӮ¬лҠ” кІҢ м•„лӢҲлҚ”лқјкі мҡ”. л§ҲмқҢмқҙ л¬ҙкұ°мӣҢ кІ¬л”ң мҲҳк°Җ м—Ҷм—Ҳм–ҙмҡ”.вҖқ
лӢӨмӢң мӢңмһ‘н•ң 1 : 1 нӣ„мӣҗ, м§ҖкёҲмқҖ л¬ҙл Ө м—ҙн•ң к°ң лӮҳлқј, 29лӘ… м•„мқҙл“Өмқҳ м—„л§Ҳк°Җ лҗҳм—ҲмҠөлӢҲлӢӨ. кІҢлӢӨк°Җ 집мңјлЎң лҚ°л ӨмҳЁ мң кё°кІ¬ м—ҙ л§ҲлҰ¬к№Ңм§Җ н•Ёк»ҳ м§ҖлӮҙлӢӨ ліҙлӢҲ мҷёлЎңмҡё нӢҲмқҙ м—ҶмҠөлӢҲлӢӨ.
к·ёл…ҖлҠ” м•„мқҙл“Өмқ„ нӣ„мӣҗн• л•Ң, мғқм• мІҳмқҢ м№ҙл©”лқјлҘј ліҙл©° л‘җл ӨмӣҢн•ҳлҠ” м•„мқҙ, мҠ¬н”Ҳ лҲҲл№ӣмқҳ м•„мқҙлҘј м„ нғқн•©лӢҲлӢӨ. мӢңк°„мқҙ мўҖ кұёлҰ¬лҚ”лқјлҸ„ к·ёл“Өм—җкІҢ л°қмқҖ лҜёмҶҢлҘј м„ л¬јн•ҳлҠ” кІғмқҙ мһҗмӢ мқҳ м—ӯн• мқҙлқјкі лҜҝкё° л•Ңл¬ёмһ…лӢҲлӢӨ.

мҠӨмң„мҠӨлЎң лҸҢм•„к°Җкі мӢ¶м§Җ м•ҠлҠҗлғҗлҠ” м§Ҳл¬ём—җ к·ёл…ҖлҠ” мҳӨнһҲл Ө м•„н”„лҰ¬м№ҙ мҡ°к°„лӢӨм—җ к°Җкі мӢ¶лӢӨкі н•©лӢҲлӢӨ. 7л…„м§ё мқём—°мқ„ л§әм–ҙмҳЁ вҖҳлҚ°ліҙлқјвҖҷмқҳ н• м•„лІ„м§Җк°Җ м–јл§Ҳ м „ лҸҢм•„к°Җм…Ёкё° л•Ңл¬ёмһ…лӢҲлӢӨ. лҚ°ліҙлқјмқҳ н• м•„лІ„м§Җк°Җ мғқм „м—җ ліҙлӮҙмҳЁ нҺём§ҖлҸ„ лҠҳ л§ҲмқҢм—җ лӮЁмҠөлӢҲлӢӨ.
вҖңмӮ¬лһ‘н•ҳлҠ” мҡ°лҰ¬ л”ё мқём§„мЈј, мҡ°лҰ¬ мҶҗмһҗл“Өмқ„ лҸҢлҙҗмӨ„ мӮ¬лһҢмқҙ мһҲм–ҙ м§ҖкёҲ лӮҳлҠ” кұұм • м—Ҷмқҙ м Җм„ёмғҒмңјлЎң к°Ҳ мҲҳ мһҲмҠөлӢҲлӢӨ.вҖқ

м•„мқҙл“Өмқҳ лҜёлһҳлҘј мң„н•ҙ мӮ¬лҠ” кІғмқҙ кі§ мһҗмӢ мқҳ н–үліөмқҙлқјлҠ” к·ёл…ҖлҠ” В м–ём к°Җ к·ёл“Өмқ„ м§Ғм ‘ л§ҢлӮ лӮ мқ„ мҶҗкјҪм•„ кё°лӢӨлҰ¬л©° мҳӨлҠҳлҸ„ лӘҪкіЁм–ҙлҘј л°°мҡ°кі , мӮ¬м§„мқ„ м°Қкі , нҺём§ҖлҘј м”ҒлӢҲлӢӨ.
вҖңмҳӣлӮ мқҳ м ҖлҠ” кјӯ н•„мҡ”н•ң мӮ¬лһҢлҸ„, мӨ‘мҡ”н•ң мӮ¬лһҢлҸ„ м•„лӢҲм—Ҳм–ҙмҡ”. л¬ҙкҙҖмӢ¬ мҶҚм—җ нҷҖлЎң мӮҙм•ҳлӢӨкі мғқк°Ғн–ҲлҠ”лҚ° м–ҙлҠҗмғҲ 진м§ң к°ҖмЎұмқҙ мғқкІјм§Җмҡ”. мқҙ м•„мқҙл“Өмқҙ м Җм—җкІҢлҠ” ліҙл¬јмқҙкі кёҲл©”лӢ¬мқҙм—җмҡ”.вҖ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