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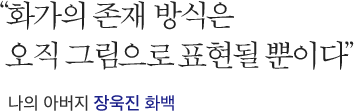
2014년 4월, 식구 모두의 숙원이었던 장욱진미술관이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야트막한 야산 아래 아름답게 자리 잡고 문을 열었다. 많은 시간을 아버지의 미술관 건립에 마음을 집중했기에, 내게는 정말 감개가 무량한 일이었다. 시간만 되면 발걸음이 미술관으로 옮겨지곤 한다. 어린아이 같은 소박한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면 마치 아버지를 뵙는 듯 가슴이 뭉클하다.
글 장경수 사진 제공 장욱진미술문화재단
“나는 심플하다”
전시장 첫머리, 나무 아래에서 팔베개를 하고 누워 계신 아버지, ‘수하(樹下 1954)’를 뵈니 철저한 자유인의 경지에 이른 듯해, 일생을 통해 ‘심플’을 보여주신, 언행이 일치되는 아버지의 모습에 눈앞이 찡해 온다.
“나는 심플하다.” 이 말은 아버지의 단골 말 중 하나이다. 순진무구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고 싶어 했던 아버지께서는 ‘심플[純眞無垢]’을 화두로 삼고 일생을 깨끗이 살려고 고집하셨던 분이다. 두어 번(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학교 등)의 길지 않은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구도의 길을 가듯 시골로 다니시며 자기 일에 몰두하셨다. 그림 그리는 일 이외에는 아무 일도 할 줄 모르는 아버지였다. 자연 가장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에 대해 식구들한테 늘 미안해했다. 그러나 당신 일에는 늘 철저했던 분이다. 그림 그리는 일이 천대받던 시절부터 일제강점기, 한국동란 등 어렵고 힘든 세월 동안 아버지께서는 그림 그리는 일을 뒤로한 적이 없으시다. “나는 6·25 사변 때를 빼놓고는 평생 붓을 놓은 적이 없다”고 자주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심 없이 그림을 주셨고, 아무리 큰돈을 주어도 못 갖는 이도 있었다. 식구에게는 전시회가 끝날 때 또는 이름 있는 좋은 날에 한 점씩 주심으로 즐거움을 주셨고, 어려웠던 시절 딸들에게는 혼수 대신 그림을 몇 점 걸어 주고 가셨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사랑이기에 우리 식구들은 아버지의 그림을 몹시 아낀다.


장욱진 작.
<진진묘(眞眞妙)>
33×24cm. 캔버스에 유채. 1970.
–
<가족도(A family Portrait)>
7.5×14.8cm. 캔버스에 유채. 1972.
“나는 평생 그림 그린 죄밖에 없다”
평소 도회지의 번거로움을 싫어하셨던 아버지는 마흔넷 되시던 해 서울대 미대 교수직을 사직하고, 남양주시 덕소의 한강 변에 작은 화실을 짓고 가족과는 떨어져 혼자 작업하는 전업 화가로서의 본격적인 삶을 시작하셨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는 숙고를 해 오신 일종의 정신적인 도정이기도 했다. 실제로 식구들에게는 가장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있었으나, 어머니를 비롯한 온 식구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아버지는 유독 많은 ‘가족도’(1972, 1978)를 그리셨는데 아마도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사회생활이 거의 없던 아버지께는 가족이 유일한 울타리였고, 한편 식구들은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애썼던 것 같다. 그에 대한 화답이 ‘가족도’로 보여지는데, 온 가족 뒤에 모습을 반쯤 숨긴 그림 속의 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무엇보다도 온 식구의 생계를 짊어진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은 늘 죄인의 마음으로 따라다녔을 것이고, 그 화답이 어머니의 초상인 ‘진진묘(眞眞妙 1970)’다. 일주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작품을 완성하자마자 덕소 아틀리에에서 서울 집으로 들고 와 어머니께 드리고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가신 일이 있다. 얼마나 애틋한 일인가. 이렇게 “나는 평생 그림 그린 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형형한 아버지의 눈빛을 작품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나, 다시 시작하겠다”
‘자화상’(1951)을 보면서 한국동란으로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을 때, 연미복을 입고 풍요로운 논밭 사이를 유유히 걸어오시며 “나,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던 아버지를 뵙는다. 이렇게 아버지는 무슨 계기가 있을 때마다 늘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만년에 아버지는 용인 마북동 고옥(현재 등록문화재로 ‘장욱진 고가’)에서 많은 그림을 그리셨다. 작품 중에는 당신 자신을 도인으로 표현한 작품(도인(道人) 1988)이 많다. 모든 잡스러움을 걷어낸 순수했던 아버지의 내면을 본다. 작품 속에서 도인으로 유유자적, 또는 홀로 좌정하시며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의지를 나는 본다.
마지막 그림으로 알려진 ‘밤과 노인’(1990)은 돌아가시기 2개월 전에 그리신 그림이다. 그때는 건강하셨고 누구도 돌아가시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때이다. 그림을 보았을 때 어머니와 나는 좀 이상한 느낌이어서 그림을 곧바로 싸서 장롱에 넣어 두었었다. 1990년 12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나는 바로 그 그림을 꺼내 보았다. 동시에 말은 안 했었지만 돌아가실 걸 예감하고 그리신 건가 하는 생각에 미치니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버지는 언젠가 “산다는 것은 소모하는 것,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죽는 날까지 그림을 위해 다 쓰고 가겠다. 나의 기능이 다하면 나는 간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해 그림도 괜찮게 된다며 많이 그리셨고 건강도 좋아 보이셔서 우리 모두를 안심시켜 놓고 그렇게 훌쩍 떠나 버리셨다. 새해에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주변 정리도 해놓으셔서 정말 깨끗하게 떠나셨다. 마지막 그림 속의 유유히 떠나는 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그곳에서 무엇을 다시 시작하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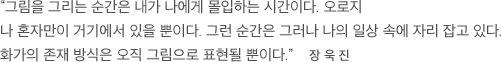

<수하(樹下, Under the Tree>
33×24t.7cm. 캔버스에 유채. 1954.

<도인(An Immortal)>
53×49cm. 캔버스에 유채. 1988.
+
<밤과 노인
(The Night and an Old Man)>
41×32cm. 캔버스에 유채. 1990.

화가 장욱진(1917~1990)님은 1918년 충남 연기에서 태어나 양정고보를 거쳐 도쿄제국 미술학교에서 수학하면서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근, 이중섭과 함께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제2세대 서양화가로, 가족, 나무, 아이, 새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한 소재들을 주로 그렸습니다. 1947년 김환기, 유영국 등과 함께 ‘사실을 새롭게 보자’란 의미로 신사실파를 결성하여, 자연 사물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닌 사물 안에 내재해 있는 근원적이고 정신적인 본질을 추구하였습니다. ‘동화적이고 심플한 표현과 독창적인 색채를 사용, 동양화적인 화법에 동양적 철학사상을 담아냈다’는 평을 받았던 그는 옛 양주군이던 덕소(1963~1974), 명륜동(1975~1979), 수안보(1980~1985)를 거쳐 용인 신갈 마북리(1986~1990)에서 작품 활동을 하던 중 생을 마쳤습니다. 지난 4월 개관한 양주 시립 장욱진미술관에서는 미술관 개관을 기념한 <장욱진> 전이 오는 8월 31일까지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