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лӮҳлҠ” 50м—¬ л…„к°„ вҖҳмқёк°„вҖҷмқ„ м°Қм–ҙмҷ”лӢӨ.
кёё мң„м—җм„ң л§ҢлӮң вҖҳмҶҢл…„вҖҷмқҖ лІҢмҚЁ л…ёмқёмқҙ лҗҳм—ҲлӢӨ.
м•„мқҙл“Өмқҳ н‘ңм •мқҖ лӯ”к°Җ мҲҳмӨҚмқҖ л“Ҝн•ҳл©ҙм„ңлҸ„
мҲңмҲҳн•Ёмқҙ л„ҳм№ңлӢӨ. лӮҳлҠ” мӮ¬м§„мқ„ м°Қмқ„ л•Ң м•„мқҙл“Өм—җкІҢ
вҖҳмӣғм–ҙ лӢ¬лқјвҖҷ вҖҳмқҙмӘҪмқ„ лҙҗ лӢ¬лқјвҖҷкі л§җн•ҳм§Җ м•ҠлҠ”лӢӨ.
лҢҖк°ң мһҲлҠ” к·ёлҢҖлЎңмқҳ лӘЁмҠөмқ„ мҲңк°„ нҸ¬м°©н•ңлӢӨ.
м—°м¶ңн•ҳлҠ” мҲңк°„ 진мӢӨмқҙ мӮ¬лқјм§Җкё° л•Ңл¬ёмқҙлӢӨ.
1950~1990л…„лҢҖм—җ л¶ҖмӮ°мқҳ мһҗк°Ҳм№ҳмӢңмһҘ, кҙ‘м•ҲлҰ¬ н•ҙліҖ,
мҳҒлҸ„ кіЁлӘ©, л¶ҖмӮ°м—ӯ л“ұм—җм„ң л§ҢлӮң мІң진н•ң м•„мқҙл“Өмқҳ
лӘЁмҠөмқҖ мқҙм м—ӯмӮ¬мқҳ кё°лЎқмңјлЎң лӮЁкІҢ лҗҳм—ҲлӢӨ.
мӮ¬м§„, кёҖ мөңлҜјмӢқ



л§үлӮҙ лҸҷмғқмқ„ лІҲм©Қ м•Ҳм•„ л“ңлҠ” нҒ°мҳӨл№ мқҳ м–јкөҙм—җ н–үліөмқҙ л„ҳм№ңлӢӨ. мһҗм „кұ° л’Өм—җ мҳҲмҒң м—¬лҸҷмғқмқ„ нғңмҡҙ мҳӨл№ лҠ” к·Җм—¬мӣҢ мЈҪкІ лӢӨлҠ” н‘ңм •мқҙлӢӨ. кі мӮ¬лҰ¬ к°ҷмқҖ мҶҗмңјлЎң мӢ л¬ёлҸ„ нҢ”кі мҡ°мӮ°лҸ„ нҢ”м§Җл§Ң мӮ¶мқҳ кі лӮңліҙлӢӨлҠ” мӮ¶мқҳ нқ¬л§қмқҙ н”јм–ҙлӮңлӢӨ. мҡ°лҰ¬м—җкІҢлҠ” лҚ”мң„лҘј н”јн•ҙ лІҢкұ°мҲӯмқҙ м•„мқҙл“Өмқҙ л¬јмһҘлӮңмқ„ міҗлҸ„ нқүмқҙ м•„лӢҲкі , мҲң진н•ң м•„мқҙл“ӨмқҖ мЈјмқёкіөм—җкІҢ н‘№ л№ м§„ лӮҳлЁём§Җ л¬ҙлҰҺмқ„ кҝҮкі кІҪкұҙн•ҳкІҢ TVлҘј ліҙлҚҳ мӢңм Ҳмқҙ мһҲм—ҲлӢӨ.

лӮҳлҠ” м§ҖкёҲлҸ„ кұ°лҰ¬м—җм„ң, кіЁлӘ©м—җм„ң м—°мӢ мӮ¬м§„мқ„ м°Қкі мһҲлӢӨ. вҖҳмқёк°„вҖҷмқ„ мЈјм ңлЎң м№ҙл©”лқјм—җ лӢҙм•„мҳЁ мқҙмң лҠ” мӮ¬м§„мқҙ мӮ¬лһҢкіј мӮ¬лһҢмқ„ мһҮкІҢ н•ҙмЈјлҠ” к°Җкөҗмқҙкё° л•Ңл¬ёмқҙлӢӨ. к·ёкІғмқҖ лӢЁмҲңнһҲ мқҙм–ҙмЈјлҠ” кІҢ м•„лӢҲлқј л§әкІҢ н•ҙмӨҖлӢӨ. вҖҳмқёк°„вҖҷмқ„ мҙ¬мҳҒн•ҳкё° мң„н•ҙм„ңлҠ” мқёк°„мқ„ мЎҙмӨ‘н•ҳкі м§„мӢ¬мңјлЎң мқҙн•ҙн• мӨ„ м•Ңм•„м•ј н•ңлӢӨ. к·ё м ҖліҖм—җ к№”лҰ° л”°л“Ҝн•ң к°җм •мқҖ л°”лЎң вҖҳм• м •вҖҷмқҙлӢӨ. лӮҳмқҳ 진м§ң мқҙм•јкё°лҠ” мқёк°„мқҳ мӮ¬лһ‘м—җ кҙҖн•ң кІғмқҙл©°, мӮ¬лһҢл“Өмқҳ л§ҲмқҢмқ„ ліҖнҷ”мӢңнӮӨлҠ” мӮ¬м§„мқҳ нһҳм—җ лҢҖн•ң кІғмқҙлӢӨ.
н•ң мһҘмқҳ мӮ¬м§„м—җлҠ” л§ҲмқҢмқ„ мқјк№Ёмҡ°лҠ” нһҳмқҙ мһҲлӢӨ. лҲ„кө¬лҸ„ нҳјмһҗ мӮҙм•„к°Ҳ мҲҳлҠ” м—ҶлӢӨ. мҡ°лҰ¬лҠ” м„ёмғҒмқҳ лӘЁл“ кІғл“Өкіј м—°кІ°лҗҳм–ҙ мһҲмңјл©°, м„ңлЎң лҸ•лҠ” к°ҖмҡҙлҚ° мқҳм§Җн•ҳкі мң„лЎңл°ӣлҠ” мЎҙмһ¬л“ӨмқҙлӢӨ. мқҙ м„ёмғҒ лӘЁл“ мӮ¬лһҢл“Өмқҙ м–ҙлҠҗ лӮ м—”к°Җ 진лҰ¬м—җ лҲҲмқ„ л– к·ёл“Өмқҙ нҳ•м ңмІҳлҹј м„ңлЎң л°°л Өн•ҳкі лӮҳлҲ„л©° н•Ёк»ҳ мӮҙм•„к°ҖкІҢ лҗҳлҠ” лӮ мқҙ мҳӨкё°лҘј, к·ёлҰ¬кі лӘЁл‘җк°Җ м–ҙлҰ°мқҙл“Өмқҳ нҷҳн•ң мӣғмқҢмІҳлҹј н–үліөн•ҙм§Җкёё л°”лһҖлӢӨ. к·ёкІғмқҙ лӮҙк°Җ мӮ¬м§„ м°ҚлҠ” мқҙмң лӢ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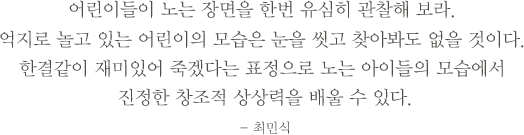


мӮ¬м§„к°Җ мөңлҜјмӢқлӢҳмқҖ 1928л…„ нҷ©н•ҙлҸ„ м—°м•Ҳм—җм„ң нғңм–ҙлӮ¬мҠөлӢҲлӢӨ. нҷ”к°Җмқҳ кҝҲмқ„ м•Ҳкі 1955л…„ мқјліёмңјлЎң кұҙл„Ҳк°”лӢӨк°Җ мҡ°м—°нһҲ н—Ңмұ…л°©м—җм„ң м—җл“ңмӣҢл“ң мҠӨнғҖмқҙкІҗмқҳ мӮ¬м§„집 <мқёк°„к°ҖмЎұ>мқ„ м ‘н•ң лӢҳмқҖ мӮ¬м§„мһ‘к°Җк°Җ лҗҳкё°лЎң кІ°мӢ¬н•ң л’Ө м§ҖкёҲк№Ңм§Җ м„ңлҜјл“Өмқҳ мӮ¶мқҳ лӘЁмҠөмқ„ лӢҙм•„мҷ”мҠөлӢҲлӢӨ. 2008л…„ 13л§Ңм—¬ м җмқҳ мһҗлЈҢлҘј көӯк°Җкё°лЎқмӣҗм—җ кё°мҰқн•ҳм—¬ лҜјк°„кё°мҰқкөӯк°Җкё°лЎқл¬ј м ң1нҳёлЎң м„ м •лҗҳкё°лҸ„ н•ң лӢҳмқҖ н•ңкөӯмӮ¬м§„л¬ёнҷ”мғҒ(1974), мҳҲмҲ л¬ёнҷ”лҢҖмғҒ(1987), лҢҖн•ңлҜјкөӯ мҳҘкҙҖл¬ёнҷ”нӣҲмһҘ(2000), л¶ҖмӮ°л¬ёнҷ”лҢҖмғҒ(2009) л“ұмқ„ мҲҳмғҒн–Ҳмңјл©°, м Җм„ңлЎңлҠ” <мқёк°„> мӢңлҰ¬мҰҲ 14집 мҷём—җ <лӮ®мқҖ лҚ°лЎң мһ„н•ң мӮ¬м§„> <лӢӨнҒҗл©ҳн„°лҰ¬лЎң мӮ¬м§„мқ„ л§җн•ҳлӢӨ> <мӮ¬лһҢмқҖ л¬ҙм—ҮмңјлЎң к°ҖлҠ”к°Җ> л“ұ лӢӨмҲҳк°Җ мһҲмҠөлӢҲлӢӨ.
+
мөңлҜјмӢқ мһ‘к°Җмқҳ лҜёкіөк°ңмһ‘ мӮ¬м§„ 150м—¬ м җмқҙ вҖҳмҶҢл…„мӢңлҢҖвҖҷлқјлҠ” мЈјм ңлЎң м „мӢң мӨ‘мһ…лӢҲлӢӨ. 6мӣ” 13мқјл¶Җн„° 7мӣ” 8мқјк№Ңм§Җ лЎҜлҚ°к°Өлҹ¬лҰ¬ ліём җ(02-726-4456)м—җм„ң, 7мӣ” 20мқјл¶Җн„° 8мӣ” 13мқјк№Ңм§Җ лЎҜлҚ°к°Өлҹ¬лҰ¬ мӨ‘лҸҷм җ(032-320-7605)м—җм„ң, 8мӣ” 15мқјл¶Җн„° 9мӣ” 5мқјк№Ңм§Җ лЎҜлҚ°к°Өлҹ¬лҰ¬ лҢҖм „м җ(042-601-2827)м—җм„ң, 9мӣ” 19мқјл¶Җн„° 10мӣ” 11мқјк№Ңм§Җ лЎҜлҚ°к°Өлҹ¬лҰ¬ м•Ҳм–‘м җ(031-463-2715)м—җм„ң м—ҙлҰҪлӢҲлӢӨ. мӮ¬м§„ м ңкіө _ лЎҜлҚ° к°Өлҹ¬лҰ¬ ліём 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