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ÍłÄ ÍĻÄž£ľŲ̄ 26žĄł. Í∂ĆŪą¨ žĄ†žąė, ŽĚľžĚīŪäłŪĒĆŽĚľžĚīÍłČ žĄłÍ≥Ą žĪĒŪĒľžĖł
Žß§žĚľ žēĄžĻ® ŽāėŽäĒ 15Ūā¨Ž°úŽĮłŪĄįŽ•ľ Žč¨Ž¶įŽč§.
ŽĻĄÍįÄ žė§Žāė ŽąąžĚī žė§Žāė Žč¨Ž¶įŽč§. ŪĒĄŽ°ú ŽćįŽ∑Ē žĚīŪõĄ žßÄÍłąÍĻĆžßÄ Í≥ĄžÜ掟ėŽäĒ ŪēėŽ£®žĚė žčúžěĎžĚīŽč§. ‚Äėžė§Žäė ŪēėŽ£®žĮ§ ŽĻľŽ®ĻžĚĄÍĻĆ?‚Äô ŪēėŽäĒ žÉĚÍįĀžĚī žóī Ž≤ąŽŹĄ ŽćĒ Žď§ ŽēĆŽŹĄ žěąžßÄŽßĆ, Í∑łŽüī ŽēĆŽßąŽč§ ŽāėžôÄžĚė žēĹžÜćžĚĄ ŽĖ†žė¨Ž¶įŽč§. Žß§žĚľ žēĄžĻ® Žč¨Ž¶¨ŽäĒ žĚīžú†ŽäĒ žč¨žě•žĚĄ ŪēėŽāė ŽćĒ ŽßĆŽď§Íłį žúĄŪēīžĄúŽč§. 10ŽĚľžöīŽďúŽ•ľ ŽõįŽäĒ ŪĒĄŽ°ú žĄ†žąėÍįÄ ŽźėŽ†§Ž©ī, žč¨žě•žĚī ŪēėŽāėŽ°úŽäĒ Ž™®žěźŽěÄŽč§. Íįēž≤† ÍįôžĚÄ žč¨žě•žĚĄ ŽßĆŽďúŽäĒ ÍĪī ŪēėŽ£®ŪēėŽ£® ŪĚėŽ¶¨ŽäĒ žěĎžĚÄ ŽēÄŽį©žöłžĚīŽ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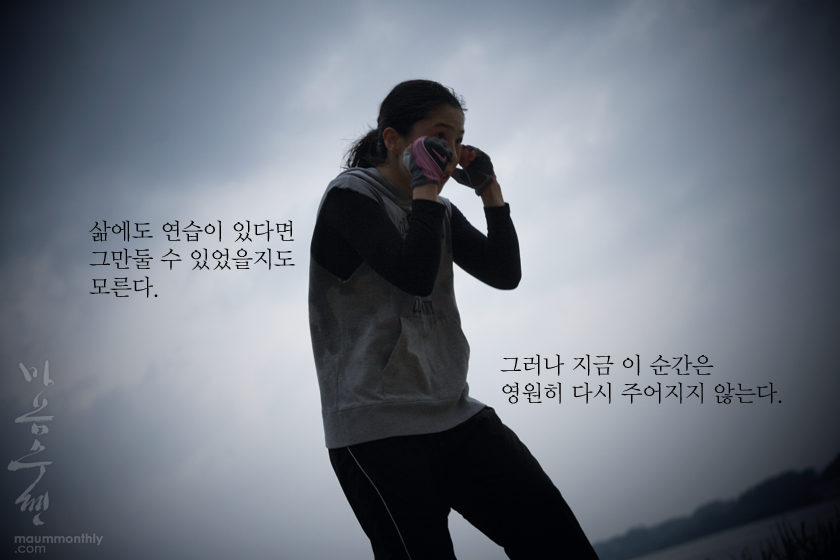
ž§ĎŪēôÍĶź 2ŪēôŽÖĄ. ŪēúžįĹ Í≥ĶŽ∂ÄŪē† ŽāėžĚīžóź ŪēôÍĶźŽßĆ ŽßąžĻėŽ©ī ž≤īžú°ÍīÄžúľŽ°ú ŪĖ•ŪĖąŽč§. žěĎžĚÄ ž£ľŽ®Ļžóź ŪĒľŽ©ćžĚī Žď§ ŽēĆÍĻĆžßÄ žĄúŽĄą žčúÍįĄžĒ© žÉĆŽďúŽįĪŽßĆ ž≥źŽĆĒŽč§.
ŽāėŽäĒ žóīŽĎź žāī ŽēĆ žĚīŽĮł ÍįĄž†ąŪěą žõźŪēīŽŹĄ ŪēīÍ≤įŽźėžßÄ žēäŽäĒ Ž¨łž†úŽď§žĚī žěąŽč§ŽäĒ Í≤ɞ̥ žēĆžēĄŽ≤ĄŽ¶į žēĄžĚīžóąŽč§.
IMFŽ°ú Í≥Ķžě•žĚī Ž¨łžĚĄ Žčęžěź žēĄŽĻ†ŽäĒ žč§žóÖžěźÍįÄ ŽźėžóąŽč§. žė§Žěėž†ĄŽ∂ÄŪĄį žēĄŽĻ†žôÄ žā¨žĚīÍįÄ žēą žĘčžēėŽćė žóĄŽßąŽäĒ žßϞ̥ ŽāėÍįĒŽč§. Í∑łŽüį ŽćįŽč§ žēĄŽĻ†ŽäĒ ŽčĻŽá®žóź žĻėŽß§ žīąÍłį ž¶ĚžÉĀžúľŽ°ú ž†ēžÉĀž†ĀžĚł žÉĚŪôúžĚĄ Ž™Ľ ŪĖąŽč§. 5žāī ŽßéžĚÄ žĖłŽčąÍįÄ ŽāėžôÄ žēĄŽĻ†Ž•ľ Ž≥īžāīŪĒľŽ©į žÉĚŪôúžĚĄ Í峎†łŽč§. žĚīŪėľŪēú Ž∂ÄŽ™®, Ž≤óžĖīŽā† žąė žóÜŽäĒ ÍįÄŽāú‚Ķ. Žā®Žď§žóźÍ≤ĆŽäĒ žßÄÍ∑ĻŪěą ŪŹČŽ≤ĒŪēú žā∂žĚī ŽāėžóźÍ≤ĆŽäĒ ÍĻĆŽßąŽďĚŪěą ŽÜížĚī žěąžóąŽč§.
Í∑łŽüį ŽāīÍįÄ žöīŽ™Öž≤ėŽüľ Í∂ĆŪą¨Ž•ľ ŽßĆŽā¨Žč§. žĄúŽĄą žčúÍįĄžĒ© žą®žĚī Ž™©ÍĻĆžßÄ žį®žė§Ž•īŽŹĄŽ°Ě žöīŽŹôžĚĄ ŪēėÍ≥† ŽāėŽ©ī ŽßąžĚĆžĚī ŽĽ• Žöꎶ¨ŽäĒ ÍłįŽ∂ĄžĚīžóąŽč§. ŽāėŽäĒ 30Ž∂Ą ŽŹôžēą ž§ĄŽĄėÍłįŽ•ľ ŪēėŽĚľ ŪēėŽ©ī 1žčúÍįĄžĚĄ, ‚ÄėŪēėŽāėŽĎė‚Äô žóįžäĶžĚĄ 1žčúÍįĄ ŪēėŽĚľÍ≥† ŪēėŽ©ī 3žčúÍįĄžĚĄ ŪēėÍ≥§ ŪĖąŽč§.
‚ÄėŽāėŽäĒ ŽāīžĚľ, žė§ŽäėŽ≥īŽč§ ŽćĒ ŽāėžĚÄ žā¨ŽěĆžĚī ŽźúŽč§.‚Äô Í∑łŽ†áÍ≤Ć žÉĚÍįĀŪēėŽ©ī žė§ŽäėžĚī žēĄŽ¨īŽ¶¨ Í≥†ŽźėÍ≥† ŪěėŽď§žĖīŽŹĄ Ų̄Žß̞̥ ÍŅąÍŅÄ žąė žěąžóąŽč§. Í∑łŽ†áÍ≤Ć 8ÍįúžõĒ ÍįÄÍĻĆžĚī ž§ĄÍłįžį®Í≤Ć ÍłįŽ≥łÍłįŽßĆ žĚĶŪėĒŽč§.
žĖīŽäź Žā† ÍīÄžě•ŽčėžĚī Žāī ÍŅąžĚī Ž¨īžóážĚłžßÄ Ž¨ľžóąŽč§. ‚ÄúžĄłÍ≥Ą žĪĒŪĒľžĖłžĚīžöĒ.‚ÄĚ
žēĄž£ľ žė§Žěꎏôžēą ž§ÄŽĻĄŪēėÍ≥† žěąŽćė Í≤Éž≤ėŽüľ ŽāėŽäĒ Ž∂ąžĎ• ŽĆÄŽčĶŪĖąŽč§. ‚ÄúŽāėŽěĎ ÍŅąžĚī ÍįôŽĄ§. žöįŽ¶¨ ÍįôžĚī ŪēīŽ≥īžěź.‚ÄĚ
ŪēėžßÄŽßĆ ÍīÄžě•ŽčėžĚÄ Í∂ĆŪą¨Ž•ľ ÍįÄŽ•īž≥źž§Ą žÉĚÍįĀžĚÄ žēäÍ≥† Í≥ĶŽ∂ÄŪēėŽĚľŽäĒ žěĒžÜĆŽ¶¨ŽßĆ ŪēīŽĆĒŽč§. ‚ÄúÍ∂ĆŪą¨ŽäĒ ŪěėžúľŽ°ú ŪēėŽäĒ žöīŽŹôžĚī žēĄŽčąŽĚľ ž†ĄŽěĶžúľŽ°ú ŪēėŽäĒ ÍĪį‚ÄĚŽĚľŽ©į žāľÍĶ≠žßÄžôÄ žú°ÍĶį ÍĶįžā¨žěĎž†Ą ÍĶźŽ≥ł ÍįôžĚÄ žĪ̥֞ žĚĹÍ≤Ć ŪēėžÖ®Žč§. žÉą Íłįžą†žĚĄ ÍįÄŽ•īž≥źž§Ą žÉĚÍįĀžĚÄ žēäžúľžčúÍ≥† ÍłįŽ≥łÍłįŽßĆ žßÄŽŹÖŪēėÍ≤Ć žčúŪā§žÖ®Žč§.
žôú žÉą Íłįžą†žĚÄ žēą ÍįÄŽ•īž≥źž£ľžčúŽäĒžßÄ, ŪėĻžčú ŽāėžóźÍ≤Ć žč§ŽßĚŪēėžč† ÍĪī žēĄŽčĆžßÄ, ŪēėŽäĒ žĚėŽ¨łžĚī Žď§ ŽēĆŽŹĄ žěąžóąžßÄŽßĆ Í∑łÍ≤Ć žĄłÍ≥Ą žĪĒŪĒľžĖłžĚĄ ŽßĆŽďúŽäĒ ÍīÄžě•ŽčėžĚė Žį©Ž≤ēžĚīžóąŽč§.

Í∑łŽ†áÍ≤Ć Ž™á ŽÖĄÍįĄžĚė Ū䳎†ąžĚīŽč̞̥ ÍĪįžĻėÍ≥† ŽďúŽĒĒžĖī Í≤įž†ĄžĚė Žā†žĚī Žč§ÍįÄžôĒŽč§. 2004ŽÖĄ IFBA(ÍĶ≠ž†úžó¨žěźŽ≥ĶžčĪŪėĎŪöĆ) ŽĚľžĚīŪäłŪĒĆŽĚľžĚīÍłČ žĄłÍ≥Ą žĪĒŪĒľžĖłž†Ą. žÉĀŽĆĞ̳ Ž©úŽ¶¨žā¨ žĄłžĚīŪ澎äĒ ŽĮłÍĶ≠ žĄ†žąėŽ°ú 8ž†Ą ž†ĄžäĻžĚė Í∂ĆŪą¨ ž≤úžě¨žėÄŽč§. Ž™®ŽĎź Ž©úŽ¶¨žā¨žĚė žēēžäĻžĚĄ žėąžÉĀŪĖąÍ≥†, ŽāīÍįÄ žĚīÍłł ÍĪįŽĚľÍ≥† Ž≥īŽäĒ žā¨ŽěĆžĚÄ ÍīÄžě•Žčė Ūēú Ž∂ĄŽįĖžóź žóÜžóąŽč§. ÍīÄžě•ŽčėžĚÄ Ž©úŽ¶¨žā¨žóź ŽĆÄŪē≠ŪēėÍłį žúĄŪēī žä§ŪÉĞ̾žĚė Ž≥ÄŪôĒŽ•ľ žöĒÍĶ¨ŪĖąŽč§. Íłī ŪĆĒžĚĄ žĚīžö©Ūēī žõźÍĪįŽ¶¨žóźžĄú žĻėÍ≥† ŽĻ†žßÄŽäĒ Íłįžą† ŽĆÄžč†, 1ŽĚľžöīŽďúŽ∂ÄŪĄį ŽßěÍ≥† Žč§žöīŽźėŽäĒ ŪēúžĚī žěąŽćĒŽĚľŽŹĄ ŽįĒžßĚ ž†ĎÍ∑ľŪēėŽĚľÍ≥† ž£ľŽ¨łŪĖąŽč§. ŪėłŽěĎžĚīŽ•ľ žě°žúľŽ†§Ž©ī ŪėłŽěĎžĚī ÍĶīŽ°ú Žď§žĖīÍįÄžēľ ŪēėŽäĒ Í≤Éž≤ėŽüľ, Í∑ľž†ĎŪēīžĄú Ž©úŽ¶¨žā¨Ž•ľ ÍįēŪēėÍ≤Ć žēēŽįēŪēī Žď§žĖīÍįÄŽĚľŽäĒ ŽúĽžĚīžóąŽč§. Ž©úŽ¶¨žā¨ŽŹĄ ŽāėŽ•ľ žóįÍĶ¨ŪĖąŽč§Ž©ī, ŽāīÍįÄ Íłī ŪĆĒžĚĄ žĚīžö©Ūēú žěĹžúľŽ°ú ŽŹĄŽßĚÍįÄŽäĒ žä§ŪÉĞ̾žĚė Í∂ĆŪą¨Ž•ľ Ūē† Í≤ÉžĚīŽĚľÍ≥† žėąžÉĀŪĖąžĚĄ Í≤ÉžĚīŽč§. 1ŽĚľžöīŽďúŽ∂ÄŪĄį ŽāėŽäĒ Ž©úŽ¶¨žā¨žĚė žėąžÉĀžĚĄ ŽĻĄžõÉŽďĮ ŽįÄžį©Ūēī Žď§žĖīÍįÄžĄú Ž≥ĶŽ∂Ä Íłįžą†žĚĄ ÍĶ¨žā¨ŪĖąŽč§. Ž©úŽ¶¨žā¨ŽäĒ ŽāīÍįÄ ÍįÄÍĻĆžĚī Ž∂ôžĖī žěąžóąžĚƞ󟎏Ą ž†úŽĆÄŽ°ú ŪēúŽį©žĚĄ Ž®ĻžĚīžßÄ Ž™ĽŪĖąŽč§. Í≤įÍĶ≠ ŽāėŽäĒ žĄłÍ≥Ą žĪĒŪĒľžĖłžĚī ŽźėžóąŽč§. ŽßĆ 18žĄł žĶúžóįžÜĆŽ°ú žÜźžóź ž•Ē Ž≤Öžį¨ ŪÉÄžĚīŪčÄžĚīžóąŽč§.
Í∑łŪ܆Ž°Ě ÍŅąÍĺłžóąŽćė žĄłÍ≥Ą žĪĒŪĒľžĖł. žĪĒŪĒľžĖłžĚī ŽźėŽ©ī ŽßąŽÉ• ŪĖČŽ≥ĶŪēīžßą ž§ĄŽ°úŽßĆ žēĆžēėŽäĒŽćį, Í∑łÍ≤ɞ̥ žú†žßÄŪēėŽäĒ Í≤ÉžĚī ŽćĒ žĖīŽ†§žöī žĚľžĚīžóąŽč§. Žį©žĖīž†ĄžĚĄ žĻėŽ•ľ ŽēĆŽßąŽč§ ŽįúŪÜĪžĚī 6~8ÍįúžĒ© ŽĻ†ž†łŽāėÍįĒŽč§. ŽįúŪÜĪžĚī ŽĻ†ž†łŽŹĄ ŪõąŽ†®žĚĄ žČī žąėŽäĒ žóÜžóąŽč§. 2ŽÖĄ ŪõĄžóźŽäĒ ÍłČÍłįžēľ žė§Ž•łž™Ĺ žóĄžßÄŽįúÍįÄŽĚĹ ŽľąŽ•ľ 3Ž∂ĄžĚė 1žĚīžÉĀ ÍłĀžĖīŽāīŽäĒ žąėžą†žĚĄ ŽįõžēĄžēľ ŪĖąŽč§. ŽĻ†žßĄ ŽįúŪÜĪžúľŽ°ú žĄłÍ∑†žĚī žĻ®Ūą¨ŪēīžĄú žóľž¶ĚžĚĄ žĚľžúľžľįŽćė Í≤ÉžĚīŽč§.
žąėžą†žĚī ŽĀĚŽāėžěź žė§Ž•łž™Ĺ žóĄžßÄŽįúÍįÄŽĚĹžĚÄ žĚīž†ú Žįėž™ĹŽŹĄ Žā®žēĄ žěąžßÄ žēäžēėŽč§. ŽŹĄž†ÄŪěą Í∂ĆŪą¨Ž•ľ ŪŹ¨ÍłįŪē† žąė žóÜžĖī, ŪõąŽ†®žĚĄ žčúžěĎŪĖąžßÄŽßĆ Í∑†ŪėēÍįźžĚÄ žóČŽßĚžĚīžóąÍ≥†, žõÄžßĀžěĄžĚī ŽĎĒŪēīžßĄ ÍĪī žĖīž©Ē žąė žóÜžóąŽč§. Žß§žĚľ Žį§žĚĄ ž£ľž†ÄžēČžēĄ ÍįÄžäīžĚĄ žĻėŽ©į žöłžóąŽč§. žēĄŽ¨īŽ¶¨ ŽÖłŽ†•ŪēúŽč§Í≥† ŪēīŽŹĄ žčúŪē©žĚĄ ŪēīŽāľ žąė žěąžĚĄžßÄ ŽĄąŽ¨ī ŽßČŽßČŪēėÍ≥† Ž¨īžĄúžõ†Žč§.
ŪēėŽ£®ŽäĒ ÍīÄžě•ŽčėžĚī ž≤īžú°ÍīĞ󟞥ú ÍįÄžě• Ž¨īÍĪįžöī Žć§Ž≤®žĚĄ Žď§Í≥† žė§ŽĚľŽćĒŽčą Ž¨īÍ≤ĀŽÉźÍ≥† Ž¨ľžóąŽč§. Ž¨īÍ≤ĀŽč§Í≥† Ūēėžěź ÍīÄžě•ŽčėžĚÄ ž∂ē ž≤ėž†ł žěąŽćė Žć§Ž≤®žĚĄ žěąŽäĒ ŪěėÍĽŹ Žįõž≥ź žė¨Ž†§ž£ľžóąŽč§.
‚ÄúžēĄžßĀŽŹĄ ŽßéžĚī Ž¨īÍ≤ĀŽčą? ŽĄą Ūėľžěź ŪēėŽäĒ ÍĪįŽĚľÍ≥† žÉĚÍįĀŪēėžßÄ ŽßąŽĚľ. žó¨ŪÉú žöįŽ¶¨ ŽĎėžĚī ŪēīžôĒÍ≥† žēěžúľŽ°úŽŹĄ ŽĎėžĚī ŪēėŽäĒ ÍĪįžēľ. žĚīŽ†áÍ≤Ć ŽāīÍ≤Ć žĚėžßÄŪēī. Í∑łŽěėžēľ žĚīÍ≤®Žāľ žąė žěąžĖī.‚ÄĚ

Í∑łŽā† žĚīŪõĄ Ž™á ÍįúžõĒ ŽŹôžēą ŽāėŽäĒ žĚīŽ•ľ žēÖŽ¨ľÍ≥† žě¨ŪôúžĚĄ Í≤¨Žé†Žč§. 5kgžßúŽ¶¨ Ž™®Žěėž£ľŽ®łŽčąŽ•ľ žį¨ žĪĄ ŪēúÍįēŽ≥Ğ̥, ŽŹĄŽīČžāįžĚĄ ž†ąŽöĚÍĪįŽ¶¨Ž©į ÍĪłžĖī Žč§ŽÖĒŽč§. Í∑łŽü¨Ž©īžĄú žėąž†ĄžĚė ÍłįŽüȞ̥ žĄúžĄúŪěą ŪöĆŽ≥ĶŪēīÍįĒŽč§.
9ÍįúžõĒ ŪõĄ, ŽāėŽäĒ WBA žĪĒŪĒľžĖł ŪÉÄžĚīŪčÄž†ĄžóźžĄú žÉĀŽĆÄ žĄ†žąėŽ•ľ žĖīŽ†ĶžßÄ žēäÍ≤Ć žĚīÍłįŽ©į žě¨Íłįžóź žĄĪÍ≥ĶŪĖąŽč§. Í∑łŽ¶¨Í≥† žěĎŽÖĄ 9žõĒžóź žĻėŽ•ł, žĪĒŪĒľžĖł ŪÉÄžĚīŪčÄ 4ÍįúÍįÄ ÍĪłŽ¶į žčúŪē©‚Ķ.
ŽŹĄž†Ąžěź ž£ľž†úžä§ ŽāėÍįÄžôÄžĚė žĘčžĚÄ ŪéÄžĻėŽď§žĚī žā¨ž†ēžóÜžĚī Žď§žĖīžôĒÍ≥†, 4ŽĚľžöīŽďú ŽēĆŽäĒ žôľž™Ĺ žĖľÍĶīžĚī ŪôĒžāįž≤ėŽüľ ŽįÄŽ†§ žė¨ŽĚľÍįĄŽč§ŽäĒ ŽäźŽāĆžĚī Žď§žóąŽč§. žĹĒŪĒľÍįÄ ŪĚźŽ•īÍłį žčúžěĎŪēī ŪÉÄžõĒ ŽĎź ÍįúŽ•ľ ž†ĀžÖ®Žč§. ŽŹĄž†ĄžěźŽŹĄ ŽāėŽßĆŪĀľžĚīŽāė ž†ąŽįēŪĖąžĚĄ ŪĄį, žÉĀŽĆÄŽäĒ Ž∂ÄžÉĀŽčĻŪēú Í≥≥žĚĄ Í≥ĄžÜć Í≥ĶÍ≤©ŪēīžôĒŽč§. žôľž™Ĺ ŽąąžĚÄ žēĄžėą ŽįÄŽ†§ žė¨ŽĚľÍįÄ ŪäÄžĖīŽāėžė¨ ŽďĮŪĖąÍ≥†, Ž©Äž©°ŪĖąŽćė žė§Ž•łž™Ĺ ŽąąžóźŽŹĄ žĚīžÉĀ žč†ŪėłÍįÄ žôĒŽč§. žēĄžßĀ Í≤ĹÍłįÍįÄ ŽįėžĚīŽāė Žā®žēĄ žěąŽäĒ žÉĀŪô©žóźžĄú ž£ľžč¨žĚÄ ŽßĀ Žč•ŪĄįŽ•ľ Ž∂ąŽ†ÄŽč§. ŽāėŽäĒ ‚ÄėŪē† žąė žěąŽč§‚ÄôÍ≥†, ‚ÄėÍīúžįģŽč§‚ÄôÍ≥† Í≥†ÍįúŽ•ľ ŽĀĄŽćēžėÄŽč§.
1Ž∂ĄžĮ§ žßÄŽāú Ží§, ž£ľžč¨žĚī Žč§žčú Í≤ĹÍłįŽ•ľ ž§ĎŽč®žčúžľįŽč§. Ž™®ŽĎźÍįÄ Í∑ł žÉĀŪô©žóźžĄúŽäĒ Ž©ąž∂ĒŽäĒ Í≤Ć ŽčĻžóįŪēėŽč§Í≥† žÉĚÍįĀŪēėÍ≥† žěąžóąŽč§. ŪēėžßÄŽßĆ Í∑łŽüī žąėŽäĒ žóÜžóąŽč§.
žā∂žóźŽŹĄ žóįžäĶžĚī žěąŽč§Ž©ī Í∑łŽßĆŽĎė žąė žěąžóąžĚĄžßÄŽŹĄ Ž™®Ž•łŽč§. Í∑łŽü¨Žāė žßÄÍłą žĚī žąúÍįĄžĚÄ žėĀžõźŪěą Žč§žčú ž£ľžĖīžßÄžßÄ žēäŽäĒŽč§. ž†ąŽĆÄ Ž¨ľŽü¨žĄ§ žąėŽŹĄ žóÜÍ≥†, ž†ąŽĆÄ žßą žąėŽŹĄ žóÜžóąŽč§. Í≥ĄžÜć ŽāúŪÉÄž†ĄžĚĄ žĻėŽ†ÄžúľŽĮÄŽ°ú 7ŽĚľžöīŽďúŽ∂ÄŪĄįŽäĒ ŽĎė Žč§ ž≤īŽ†•žĚī ŽįĒŽč•žúľŽ°ú ŽāīŽ†§ÍįÄ žěąžóąŽč§. žĚīž†úŽ∂ÄŪĄįŽäĒ ŪŹ¨ÍłįŪēėžßÄ žēäŽäĒ žā¨ŽěĆžĚī žäĻžěźÍįÄ ŽźúŽč§. ŽąąžĚī Ž≥īžĚīžßÄ žēäžēėžßÄŽßĆ, žė§Žěú žóįžäĶžúľŽ°ú Ž™łžóź Žįī Ž≥łŽä•žĚÄ ŽāėŽ•ľ žõÄžßĀžĚīÍ≤Ć ŪĖąŽč§. ŪõĄŽįėžúľŽ°ú ÍįąžąėŽ°Ě ŽāėžĚė Í≥ĶÍ≤©žĚÄ žāīžēĄŽā¨Žč§.
10ŽĚľžöīŽďú, ŽßąžßÄŽßČ 1Ž∂Ą. ŽāėŽäĒ ŽßąžßÄŽßČ ŪěėžĚĄ ŽāīžĖī ž£ľŽ®ĻžĚĄ ŽāīžßąŽ†ÄŽč§. Í∑ł žąúÍįĄ žčúŪē© žĘÖŽ£ĆŽ•ľ žēĆŽ¶¨ŽäĒ žĘÖžĚī žöłŽ†łŽč§. žäĻŽ¶¨žĚė žó¨žč†žĚÄ Žāī žÜźžĚĄ Žď§žĖīž£ľžóąŽč§. ŽāėŽäĒ žĪĒŪĒľžĖł Ž≤®Ū䳎•ľ žßÄžľúŽÉąŽč§. žĚī žčúŪē©žĚĄ ŪÜĶŪēī 4Íįú ÍłįÍĶ¨ ŪÜĶŪē© žĪĒŪĒľžĖłžóź žė¨ŽěźÍ≥†, žīĚ 6Íįú žĄłÍ≥Ą žĪĒŪĒľžĖł ŪÉÄžĚīŪčĞ̥ žĶúžīąŽ°ú ŽĒįŽāīŽäĒ ÍłįŽ°ĚžĚĄ žĄłžõ†Žč§.

žāīŽ©īžĄú Žč§ÍįÄžė§ŽäĒ žąúÍįĄŽď§žĚÄ, Í∑łÍ≤ÉžĚī žĘčŽď† žčęŽď† ŽßěžĚīŪē† žąėŽįĖžóź žóÜŽč§. Í∑łŽěėžēľ Žėź ŽĖ†ŽāėŽ≥īŽāľ žąėŽŹĄ žěąŽäĒ Í≤ÉžĚīŽčąÍĻĆ. žôú ŪēėŪēĄ žßÄžßÄŽ¶¨ŽŹĄ ÍįÄŽāúŪēú žßĎžóź ŪÉúžĖīŽā¨žĚĄÍĻĆ? žôú ŪēėŪēĄ Ž¨īžĪÖžěĄŪēú žóĄŽßą, Žä•Ž†• žóÜŽäĒ žēĄŽĻ†Ž•ľ ŽßĆŽā¨žĚĄÍĻĆ? žĚīŽüį Í≤Ɏ吏ĚÄ ŽčĶžĚĄ ÍĶ¨Ūē† žąė žěąŽäĒ Ž¨łž†úŽď§žĚī žēĄŽčąŽč§. ‚ÄėŽĄąŽ¨ī žĖĶžöłŪēėÍłį ŽēĆŽ¨łžóź, ŽĄąŽ¨ī žēĄŪĒĄÍ≥† ŪěėŽď§Íłį ŽēĆŽ¨łžóź‚ÄôŽĚľŽäĒ ŽßźŽŹĄ žĚīž†úŽäĒ ŪēėžßÄ žēäžĚĄ Í≤ÉžĚīŽč§. ž£ľž†ÄžēČÍ≥† žč∂žĚĄ ŽēĆ Ūēú ŽįúžßĚŽßĆ ŽćĒ ŽāėÍįÄÍ≥†, Ūēú Ž≤ąŽßĆ ŽćĒ žÜźžĚĄ ŽĽóžúľŽ©ī Í∂ĆŪą¨ŽäĒ žĚīÍłīŽč§. žēĄŽßą žā∂ŽŹĄ Í∑łŽüī Í≤ÉžĚīŽč§.
žēěžúľŽ°úŽŹĄ ŽāėžĚė ŽŹĄž†ĄžĚī žĄĪÍ≥ĶŪēúŽč§ŽäĒ Ž≥īžě•žĚÄ žóÜŽč§. Žč§ŽßĆ ŽāīÍįÄ žú†žĚľŪēėÍ≤Ć ŽĮŅžĚĄ žąė žěąŽäĒ Í≤ÉžĚÄ, žĄłžÉĀžóźžĄú ÍįÄžě• ž†ēžßĀŪēú ÍĪī ŽāīÍįÄ ŪĚėŽ¶¨ŽäĒ ŽēÄŽį©žöłžĚīŽĚľŽäĒ Í≤É. Í≥ĄžÜćŪēīžĄú ŽēĞ̥ ŪĚėŽ¶¨ŽäĒ Ūēú ŽāėžĚė ŽďúŽĚľŽßąŽŹĄ Í≥ĄžÜ掟úŽč§ŽäĒ Í≤É. žĖīŽĖ§ žąúÍįĄžĚīŽď† ŽŹĄž†ĄŪē®žúľŽ°úžć® ÍįÄžě• ŽĻõŽāėŽäĒ žā¨ŽěĆžĚī ŽźúŽč§Í≥† ŽāėŽäĒ ŽĮŅŽäĒŽč§.
žěźŽ£Ć ž†úÍ≥Ķ <Ūē† žąė žěąŽč§, ŽĮŅŽäĒŽč§, ÍīúžįģŽč§> Žč§žāįžĪÖŽį©¬†

ÍĻÄž£ľŲ̄ žĄ†žąėŽäĒ 1986ŽÖĄžÉĚžúľŽ°ú 16žāīžĚī ŽźėŽćė Ūēīžóź ÍĶ≠ŽāīžóźžĄú ž≤ėžĚĆžúľŽ°ú žó¨žěź ŪĒĄŽ°ú Ž≥ĶžĄúŽ°ú ŽćįŽ∑ĒŪĖąžäĶŽčąŽč§. 2004ŽÖĄ IFBA žĪĒŪĒľžĖł Ž≤®Ū䳎•ľ ŽĒįŽāīŽ©į ŽßĆ 18žĄłžóź žĶúžóįžÜĆ žó¨žěź žĄłÍ≥Ą žĪĒŪĒľžĖłžĚī ŽźėžóąžúľŽ©į, 2006ŽÖĄ žóĄžßÄŽįúÍįÄŽĚĹ ŽľąŽ•ľ žěėŽĚľŽāīŽäĒ žąėžą†Ž°ú žĄ†žąė žÉĚŪôúžóź žĻėŽ™Öž†ĀžĚł žúĄÍłįŽ•ľ ŽßěžēėžßÄŽßĆ žēÖžį©ÍįôžĚī žě¨Ūôú ŪõąŽ†®žóź žěĄŪēī WBA žĪĒŪĒľžĖł ŪÉÄžĚīŪčĞ̥ ŽĒįŽāīŽ©į žě¨ÍłįŪĖąžäĶŽčąŽč§. 2010ŽÖĄ 9žõĒ WIBA¬∑WIBF¬∑GBU¬∑WBF 4Íįú ÍłįÍĶ¨ ŪÜĶŪē© žĄłÍ≥Ą žĪĒŪĒľžĖłžóź žė§Ž•īŽ©į žĶúžīąŽ°ú 6Íįú ÍłįÍĶ¨ žĄłÍ≥Ą žĪĒŪĒľžĖł ŪÉÄžĚīŪčĞ̥ ŪöćŽďĚŪēėŽäĒ ÍłįŽ°ĚžĚĄ žĄłžõ†žúľŽ©į, ž†ÄžĄúŽ°ú <Ūē† žąė žěąŽč§, ŽĮŅŽäĒŽč§, ÍīúžįģŽč§>ÍįÄ žěąžäĶŽčąŽ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