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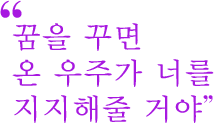
žė§žäĻÍīÄ 24žĄł. Ūēúžč†ŽĆÄŪēôÍĶź žā¨ŪöĆŽ≥ĶžßÄŪēôÍ≥ľ

žĄúžöłžčú žÜ°ŪĆĆÍĶ¨ Ž¨łž†ēŽŹô ŽĀ̞쟎ĚĹ, Í≥†žłĶ ŽĻĆŽĒ©Žď§ žā¨žĚīžóź ŽāģÍ≤Ć Ž™®žó¨ žěąŽćė ŽĻĄŽčźŪēėžöįžä§Žď§. žā¨ŽěƎ吏Ěī ‚ÄėÍįúŽĮłŽßąžĚĄ‚ÄôžĚīŽĚľ Ž∂ąŽ†ÄŽćė Í∑łÍ≥≥žĚī ŽāėžĚė Í≥†ŪĖ•žĚīžěź ŽāėžĚė ŽßąžĚƞ̥ ÍłłŽü¨ž§Ä ŽŅĆŽ¶¨žĚīŽč§. ÍįúŽĮłŽßąžĚĄžĚÄ 1980ŽÖĄŽĆÄ, žßĎ žóÜÍ≥† ŽŹą žóÜŽäĒ žā¨ŽěƎ吏Ěī ŪēėŽāė ŽĎėžĒ© ŽĻą ŽĻĄŽčźŪēėžöįžä§žóź Žď§žĖīžôÄ žāīÍ≤Ć ŽźėŽ©īžĄú žÉĚÍłī ŽßąžĚĄžĚīžóąŽč§. ŪĆźžěźŽ•ľ ŽĆÄÍ≥† Í∑ł žúĄžóź ŽĻĄŽčźžĚĄ ŽćßžĒĆžöī ŪĆźžě£žßώ吏ĚīžóąŽäĒŽćį, ŽāīÍįÄ Íįď ŽŹĆžĚī žßÄŽā† Ž¨īŽ†Ķ žöįŽ¶¨ žßĎŽŹĄ žā¨ž†ēžĚī žĖīŽ†§žõĆžßÄŽ©į žĚīÍ≥≥žóź žěźŽ¶¨Ž•ľ žě°Í≤Ć ŽźėžóąŽč§ ŪēúŽč§.
žā¨ŽěĆŽď§ ŽąąžóźŽäĒ ‚ÄėÍįÄŽāú‚ÄôŪēú ŽßąžĚĄžĚīžóąžĚĄžßÄ Ž™®Ž•īžßÄŽßĆ, ŽāėŽäĒ žöįŽ¶¨ ŽßąžĚĄžĚī žĘčžēėŽč§. ž£ľŽ≥ÄžúľŽ°úŽäĒ ŽÖľÍ≥ľ Žį≠žĚī Ūéľž≥źž†ł žěąžóąÍ≥†, žěĎžĚÄ ŽŹĄŽěĎÍ≥ľ ŪĀį ŽāėŽ¨īŽď§ Í∑łŽ¶¨Í≥† ŽßéžĚÄ Žď§ÍĹɎ吏Ěī žěąŽäĒ Í≥≥, ŽßąžĻė ŽŹĄžč¨ ŪēúÍįÄžöīŽćįžĚė žčúÍ≥® ÍįôžēėŽč§.
žĚłžč¨ŽŹĄ ž†ēŽßź žĘčžēėŽč§. žĖīŽ•łŽď§žĚÄ ŽßąžĻė ŽŹôŽĄ§ žēĄžĚīŽď§žĚĄ žěźžč†žĚė žēĄžĚīŽď§ž≤ėŽüľ Ž≥īžāīŪĒľžÖ®Žč§. žßÄž†ÄŽ∂ĄŪēú ÍĶźŽ≥ĶžĚīŽāė ŽÜÄŽč§ÍįÄ žįĘžĖīžßĄ ÍĶźŽ≥ĶžĚĄ Ž≥īŽ©ī Ž¨īŽ£ĆŽ°ú žĄłŪÉĀŪēīž£ľÍ≥† žąėžĄ†Ūēīž£ľŽćė žĄłŪÉĀžÜĆ žēĄž§ĆŽßą, žēĄžĚīŽď§žĚė Ž®łŽ¶¨ŽäĒ žĖłž†úŽāė ŽįėÍįížóź žěėŽĚľž£ľŽćė ŽĮłžö©žč§ ŽąĄŽāė‚Ķ. Í∑łŽ¶¨Í≥† Žč¨ŪĆĹžĚīÍĪīžĄ§ žēĄž†ÄžĒ®Žď§žĚī žěąžóąŽč§. žßÄŽ¨ľŪŹ¨žßĎ, ž≤†Ž¨ľž†ź, žĚłŪÖĆŽ¶¨žĖī ŪēėžčúŽäĒ žēĄž†ÄžĒ®Žď§žĚī ŽßąžĚƞ̥ Ž™®žēĄ ž°įŪē©žĚĄ ŽßƎ吏Ėī, žā¨ž†ēžĚī žĖīŽ†§žöī žßĎžĚė Ž≤ĹžßÄŽŹĄ ŽįúŽĚľž£ľÍ≥†, žě•ŪĆźŽŹĄ ÍĻĒžēĄž£ľÍ≥†, Í≥†žě• Žāú Í≥≥ŽŹĄ Í≥†ž≥źž£ľŽäĒ Í≤ÉžĚīŽč§.
Í∑łŽ¶¨Í≥† ‚ÄėÍŅąŽāėŽ¨īŪēôÍĶź‚ÄôŽĚľŽäĒ Í≥≥ŽŹĄ žěąžóąŽč§. Ž∂ÄŽ™®ŽčėžĚī ÍĪįžĚė ŽßěŽ≤ĆžĚīŽ•ľ ŪēėžÖĒžĄú žēĄžĚīŽď§žĚĄ ŽŹĆŽīźž§Ą žąė žóÜŽäĒ žßĎžĚī ŽßéžēėÍłįžóź, žó¨Žü¨ žā¨ŽěƎ吏Ěī ŪěėžĚĄ Ž™®žēĄ žēĄžĚīŽď§žĚĄ žúĄŪēú Í≥ĶŽ∂ÄŽį©žĚĄ ŽßĆŽď† Í≤ÉžĚīŽč§.
Í∑łŽ†áÍ≤Ć Ūē≠žÉĀ žĖīŽ•łŽď§ÍĽė ŽįõÍłįŽßĆ ŪēėŽ©į, Žėź Í∑łŽüį Ž™®žäĶžĚĄ Ž≥īŽ©į žěźŽěÄ ŽāėŽäĒ, ŽāėŽŹĄ Ž™®Ž•īÍ≤Ć Ūē®ÍĽė ŽāėŽąĄŽ©į žāįŽč§ŽäĒ Í≤ÉžĚī žĖīŽĖ§ Í≤ɞ̳žßÄ Ž™łžúľŽ°ú ž≤īŽďĚžĚī ŽźėžĖīÍįĒŽćė Í≤É ÍįôŽč§.
Í∑łŽüįŽćį žįł žĚīžÉĀŪĖąŽč§. ŽāėŽäĒ ÍįÄŽāúžĚī Ž∂ÄŽĀĄŽüĹžßÄ žēäžēėŽäĒŽćį ŪēôÍĶźŽ•ľ Žč§ŽčąŽ©īžĄú ž†źž†ź žúĄž∂ēžĚī ŽźėžĖīÍįĒŽč§. ŪēėÍĶ£ÍłłžĚīŽ©ī žĻúÍĶ¨Žď§Í≥ľ ÍįąŽ¶ľÍłłžóź žĄúŽäĒ Žāė. žĻúÍĶ¨Žď§žĚÄ ŽÜíŽĒĒŽÜížĚÄ ŪĆ®ŽįÄŽ¶¨žēĄŪĆĆŪ䳎°ú ŪĖ•ŪēėÍ≥†, ŽāėŽäĒ ÍįúŽĮłŽßąžĚĄŽ°ú Žď§žĖīžĄ†Žč§. ž†źžį® ŽāėŽ•ľ ŽĖ≥ŽĖ≥ŪēėÍ≤Ć ŽďúŽü¨ŽāīŽäĒ Í≤ÉŽŹĄ, žĻúÍĶ¨Žď§žĚĄ žßĎžúľŽ°ú Ž∂ÄŽ•īŽäĒ Í≤ÉŽŹĄ Ž∂ÄŽĀĄŽü¨žõĆž†łÍįĒŽč§. Ūē≠žÉĀ ž†ĄŪēīžßÄŽäĒ ž≤†ÍĪį žÜĆžčĚ, Ž∂ąžēąŪēīŪēėŽäĒ Ž∂ÄŽ™®ŽčėÍ≥ľ ŽßąžĚĄ žĖīŽ•łŽď§, ÍįÄŽāúŪēú žěźžôÄ Ž∂Ğ쟎°ú ŽāėŽČėŽäĒ žā¨ŪöĆžĚė žčúžĄ†Žď§ žÜćžóźžĄú Í≤™Í≤Ć ŽźėŽäĒ žĖĶžöłŪē®Í≥ľ Ž∂ĄŽÖł, žóīŽďĪÍįź‚Ķ. Í∑łŽüį Í≤Ɏ吏Ěī ŽßąžĚĆžÜćžóź žĆďžó¨ÍįĒŽč§.
Í∑łŽü¨Žč§ ŽāīÍįÄ Í≥†1žĚī ŽźėžóąžĚĄ ŽēĆ žöįŽ¶¨ ŽßąžĚĄžóź ‚ÄėŽ¨īžßÄÍįúŽĻõž≤≠ÍįúÍĶ¨Ž¶¨‚ÄôŽĚľŽäĒ ž≤≠žÜĆŽÖĄŽď§žĚĄ žúĄŪēú ž†ēžčĚ Í≥ĶŽ∂ÄŽį©žĚī žÉĚÍ≤®Žā¨Žč§. žĚīÍ≥≥žóź ž†ĄŽčī ÍĶźžā¨Ž°ú žė§žč† žĚīžú§Ž≥Ķ žĄ†žÉĚŽčėžĚī ž†úžĚľ Ž®ľž†Ä ž∂ĒžßĄŪēú Í≤ÉžĚÄ ŽįīŽďúŽ•ľ Í峎¶¨ŽäĒ Í≤ÉžĚīžóąŽč§. žĄ†žÉĚŽčėžĚÄ žēĄžĚīŽď§žĚė ŽāģžēĄžßĄ žěźž°īÍįźžĚĄ ŽĀĆžĖīžė¨Ž†§ž£ľÍ≥†, žěźžč†ÍįźŽŹĄ žč¨žĖīž£ľÍ≥†, žĄúŽ°ú ÍįĄžóź ŽĀąŽĀąŪēú ž†ēŽŹĄ žč¨žĖīž£ľÍ≥† žč∂žóąŽćė Í≤ÉžĚīŽč§. žöįŽ¶¨ŽäĒ Í∑łÍ≥≥žĚĄ ž§Ąžó¨žĄú ‚ÄėŽ¨īž≤≠‚ÄôžĚīŽĚľ Ž∂ąŽ†ÄÍ≥†, žĄ†žÉĚŽčėžĚÄ žöįŽ¶¨Žď§žóźÍ≤Ć žĚĆžē̥֞ ÍįÄŽ•īž≥źž£ľžÖ®Žč§. ÍłįŪÉÄ, Ž≤†žĚīžä§ÍłįŪÉÄ, Ūā§Ž≥īŽďú, ŽďúŽüľ‚Ķ. ŽāīÍįÄ Žįįžöī Í≤ÉžĚÄ ŽďúŽüľžĚīžóąŽäĒŽćį, ž≤ėžĚĆžóźŽäĒ žēÖÍłįÍįÄ žóÜžĖīžĄú ŪŹźŪÉÄžĚīžĖīŽ•ľ ÍįÄžßÄÍ≥† žóįžäĶžĚĄ ŪĖąŽč§. žĚĆžē̥֞ žěė Ž™įŽěźžßÄŽßĆ, Í∑łŽ†áÍ≤Ć žóįžäĶŪēėŽäĒ žčúÍįĄžĚī ŽĄąŽ¨ī ž¶źÍĪįžõ†Žč§.



Ž¨īžßÄÍįúŽĻõž≤≠ÍįúÍĶ¨Ž¶¨(ž§ĄžěĄŽßź: Ž¨īž≤≠)ŽäĒ ž≤≠ÍįúÍĶ¨Ž¶¨ž≤ėŽüľ žĖīŽĒĒŽ°ú ŪäąžßÄ Ž™®Ž•īžßÄŽßĆ ÍįĀžěź žěźÍłįŽßĆžĚė Žč§žĖĎŪēú žÉČÍĻĒžĚĄ ÍįĞߥ žēĄžĚīŽď§žĚī Ž¨īžßÄÍįĮŽĻõž≤ėŽüľ žēĄŽ¶ĄŽč§žöī ŽĻõÍĻĒŽ°ú Ūē®ÍĽė žĖīžöįŽü¨ž°ĆžúľŽ©ī žĘčÍ≤†Žč§ŽäĒ žÜĆŽß̞̥ ŽčīžĚÄ žĚīŽ¶ĄžĚīŽč§. ŪėĄžě¨ žĚīÍ≥≥žóź ŽďĪŽ°ĚŪēú ŪēôžÉĚžĚī 45Ž™Ö. ‚Äėž≤≠ÍįúÍĶ¨Ž¶¨ŽįīŽďú‚ÄôŽäĒ Í∑łŽŹôžēąžĚė ŽāėŽąĒ ŪôúŽŹôŽď§žĚĄ žĚłž†ēŽįõžēĄ, 2010ŽÖĄ ŽĆÄŪēúŽĮľÍĶ≠ŪúīŽ®ľŽĆÄžÉĀ ŪúīŽ®ľŽĄ§ŪäłžõĆŪĀ¨žÉĀžĚĄ žąėžÉĀŪĖąŽč§. Ž¨īž≤≠ žēĄžĚīŽď§žĚĄ žúĄŪēú žÉąŽ°úžöī Í≥ĶÍįĄ ‚Äėž¶źÍĪįžöīÍįÄ‚Äô žěÖÍĶ¨žóź ŽŹĄžõĞ̥ ž£ľžč† Ž∂ĄŽď§žĚė Í∑łŽ¶ľžĚĄ žÉąÍ≤® ŽĄ£žóąŽč§.
‚Äúžôú žöįŽ¶į žó¨ÍłįžĄú ŪÉúžĖīŽāú ÍĪįž£†?‚ÄĚ ‚ÄúŽ∂ąžĆćŪēėÍ≤Ć Ž≥īžßÄ Žßą.‚ÄĚ ‚ÄúžöįŽ¶ī Í∑łŽÉ• Žāī Ž≤ĄŽ†§ŽĎ¨žöĒ.‚Ä̂Ķ
ŽÖłŽěėŽ•ľ ŪēėŽ©į žöįŽ¶¨ žÜćžóź ŽßļŪėÄ žěąŽćė Í∑łŽüį Í≤Ɏ吏̥ ŪíÄžĖīÍįĒŽćė Í≤É ÍįôŽč§. žöįŽ¶¨ŽäĒ ŪŹČžÜĆžóźŽäĒ ÍĪłžĖī Žč§ŽčąŽ©īžĄú žį®ŽĻĄŽ•ľ Ž™®žúľÍ≥†, Žį©Ūēô ŽēĆŽäĒ žēĄŽ•īŽįĒžĚīŪ䳎•ľ ŪēīžĄú ŽŹąžĚĄ Ž™®žēėŽč§. ÍĪįÍłįžóź žĖīŽ•łŽď§žĚī ŪõĄžõźŪēīž£ľžčúŽäĒ ŽĻĄžö©žĚĄ Ž≥īŪÉú ž†źžį® žēÖÍłįŽď§ŽŹĄ ÍĶ¨ŽĻĄÍįÄ ŽźėžĖīÍįĒŽč§.
ŽĎź Žč¨ ŽßĆžóź ž≤ę Í≥Ķžóį, žā¨ŽěƎ吏Ěė ŽįėžĚĎžĚÄ Žú®ÍĪįžõ†Í≥† ‚Äėž≤≠ÍįúÍĶ¨Ž¶¨ŽįīŽďú‚ÄôÍįÄ žěėŪēúŽč§ŽäĒ žÜĆŽ¨łžĚī ŽāėŽ©īžĄú žó¨Íłįž†ÄÍłįžĄú žöįŽ¶¨Ž•ľ Ž∂ąŽü¨ž£ľÍłį žčúžěĎŪĖąŽč§. ŽßąžĚĄ Ūē†Ž®łŽčąŽď§žĚĄ Ž™®žčúÍ≥†, Žėź žöįŽ¶¨žôÄ ŽĻĄžä∑Ūēú ŽĻĄŽčźŪēėžöįžä§ žīĆžóź žĚĎžõź Í≥ĶžóįŽŹĄ ÍįĒŽč§. žĚľŽÖĄžóź Ūēú Ž≤ąžĒ©žĚÄ žĖīŽ†§žöī žĚīžõɞ̥ žúĄŪēú Ž™®Íłą Í≥ĶžóįŽŹĄ ŪĖąŽč§. ŽďúŽüľžĚĄ žĻ† ŽēĆŽßąŽč§, žā¨ŽěƎ吏Ěī ŪôėŪėłŪēīž§Ą ŽēĆŽßąŽč§, Žāī žēąžóźžĄú Ž≠ĒÍįÄÍįÄ ÍŅąŪčÄÍĪįŽ†łŽč§.
žöįŽ¶¨ŽŹĄ ŽąĄÍĶįÍįÄŽ•ľ žúĄŽ°úŪē† žąė žěąÍĶ¨Žāė, ŽāėŽŹĄ Ūē† žąė žěąÍĶ¨Žāė~! ŽāėŽäĒ ÍįÄŽāúŪēėŽčąÍĻĆ, ŽāėŽäĒ Í≥ľžôłŽ•ľ ŽįõžĚĄ žąėÍįÄ žóÜžúľŽčąÍĻĆ, ŽāėŽäĒ ~ÍįÄ žēą ŽźėŽčąÍĻĆ, Í∑łŽ†áÍ≤Ć ŪÉďŪēėÍ≥† ŪēĎÍ≥ĄŽ•ľ ŽĆÄÍłįŽ≥īŽč§, žöįŽ¶¨ÍįÄ žěėŪēėŽäĒ Í≤ɞ̥ žįĺžēĄ ŪēėŽ©ī ŽźėÍ≤†ÍĶ¨Žāė, ŪēėŽäĒ žěźžč†ÍįźŽŹĄ žčĻŪĄįÍįĒŽč§.
žĚīž†úŽäĒ Í∑łŽ†áÍ≤Ć ÍįôžĚÄ žčúÍłįŽ•ľ Ž≥īŽÉąŽćė žĻúÍĶ¨Žď§Í≥ľ ŽŹôžÉ̎吏Ěī Žč§Žď§, ŽĆÄŪēôžÉĚžĚī ŽźėÍ≥† žßĀžě•žĚłžĚī ŽźėžóąŽč§. ‚ÄėžöįŽ¶¨žóźÍ≤Ć ‚ÄėŽ¨īž≤≠‚Äô ÍįôžĚÄ Í≥ĶÍįĄžĚī žóÜžóąŽč§Ž©ī?‚Äô žä§žä§Ž°úžóźÍ≤Ć Ž¨ĽÍ≥§ ŪēúŽč§. žĖīŽĖ§ ŽįėŪē≠žĚĄ ŪēīŽŹĄ žĖłž†úŽāė Í∑łŽč§žĚĆ Žā†žĚīŽ©ī žēĄŽ¨īŽ†ážßÄ žēäÍ≤Ć žēąžēĄž£ľŽćė žĄ†žÉĚŽčė, Ž™á Ž≤ąžĚė ž≤†ÍĪį žúĄÍłį ŽēĆŽßąŽč§ Í≥ĶÍįĄžĚĄ ŽßąŽ†®Ūē† žąė žěąÍ≤Ć ŽŹĄžôÄž§Ä ŽßąžĚĄžĚė žĖīŽ•łŽď§, žēĄŽ¨ī ŽĆÄÍįÄ žóÜžĚī žöįŽ¶¨žĚė Í≥ĶŽ∂ÄŽ•ľ Žīźž£ľŽćė ŽĆÄŪēôžÉĚ žĄ†žÉĚŽčėŽď§‚Ķ. Í∑łŽüį Ž∂ĄŽď§žĚī žóÜžóąŽč§Ž©ī žöįŽ¶¨ÍįÄ ÍŅąžĚĄ žįĺžĚĄ žąė žěąžóąžĚĄÍĻĆ?
Í∑łŽěėžĄú žöįŽ¶¨ŽäĒ ŪäĻŽ≥ĄŪěą žēĹžÜćžĚĄ ŪēėžßÄ žēäžēėžĖīŽŹĄ žĚīÍ≥≥žóź žė®Žč§.


‚Äėž¶źÍĪįžöīÍįÄ‚Äô. Ž¨īžßÄÍįúŽĻõž≤≠ÍįúÍĶ¨Ž¶¨ žēĄžĚīŽď§, ŽßąžĚĄ žā¨ŽěĆŽď§ ŽąĄÍĶ¨Žāė žôÄžĄú žį®ŽŹĄ ŽßąžčúÍ≥† žČ¨žĖīÍįą žąė žěąŽäĒ ŽßąžĚĄžĚė žā¨ŽěĎŽį© ÍįôžĚÄ Í≥≥. 2010ŽÖĄ 9žõĒ, ÍįúŽĮłŽßąžĚĄžĚė ž≤†ÍĪį žÜĆžčĚžúľŽ°ú Ž¨īž≤≠žĚė Í≥ĶÍįĄžĚī žóÜžĖīžßą žúĄÍłįžóź ž≤ėŪēėžěź, ŽßąžĚĄ Ž∂ĄŽď§žĚī ŪěėžĚĄ Ž™®žēĄ ŽßĆŽď† Í≥ĶÍįĄžĚīŽč§. Žāė(žôľž™Ĺ)ŽäĒ ŽįīŽďúžč§žóźžĄú ŪõĄŽįįŽď§žĚĄ ÍįÄŽ•īžĻúŽč§.


žĚīÍ≥≥žóź žĖīŽ¶į žčúž†ąžĚė ŽāėŽ•ľ Ž≥īŽäĒ ŽďĮŪēú žēĄžĚīŽď§žĚī žěąŽč§. žÜĆÍ∑Ļž†ĀžĚīÍ≥†, žěźžč† žēąžĚė žóīž†ēžĚÄ žěąžßÄŽßĆ žä§žä§Ž°úŽ•ľ žČĹÍ≤Ć ŪĎúŪėĄŪēėžßÄ Ž™ĽŪēėŽäĒ žĻúÍĶ¨Žď§‚Ķ. ŪÉúÍ≥§žĚīŽäĒ žßĀžě•žĚĄ Žč§ŽčąŽäĒŽćį, ŪáīÍ∑ľŪēėŽ©ī Ūē≠žÉĀ žĚīÍ≥≥žúľŽ°ú žôÄžĄú ŽŹôžÉ̎吏̥ žĪôÍłīŽč§. ŽĮłžą†žĚĄ ž†ĄÍ≥ĶŪēėŽäĒ žĄĪžöĪžĚīŽäĒ ŽßĆŪôĒ ŽŹôžēĄŽ¶¨Ž•ľ, žĄĪÍĶ≠žĚīŽäĒ Ž≤†žĚīžä§ÍłįŪÉÄŽ•ľ ÍįÄŽ•īž≥źž£ľÍ≥†, žöīŽŹôžĚĄ žěėŪēėŽäĒ žÉĀžč†žĚīŽäĒ žēĄžĚīŽď§Í≥ľ ÍįôžĚī ž≤īžú° ŪôúŽŹôžĚĄ ŪēúŽč§.
ŽāėŽäĒ ŽįīŽďú ŪõĄŽįįŽď§žĚĄ ÍįÄŽ•īžĻėŽ©į, Ž™á Žč¨ ž†ĄŽ∂ÄŪĄį, ŽŹôŽĄ§ ž£ľŽ∂Ä ŽįīŽďúžĚł ‚ÄėÍŅąŽßąŽįīŽďú‚ÄôŽ•ľ ŽßƎ吏ĖīžĄú ÍįÄŽ•īžĻėÍ≥† žěąŽč§. ž£ľŽ∂ÄŽčėŽď§žĚī žä§žä§Ž°ú ŽāėŽŹĄ Ž≠ĒÍįÄŽ•ľ Ūē† žąė žěąŽč§ŽäĒ žěźžč†ÍįźžĚĄ žįĺŽäĒ ÍłįŪöĆŽ•ľ ŽďúŽ¶¨Í≥† žč∂žóąŽč§. žöįŽ¶¨ŽäĒ žĚīŽüį ŪôúŽŹôŽď§žĚĄ ŪÜĶŪēī Ūēú žā¨ŽěĆžĚī ŽßąžĚƞ̥ žĖīŽĖĽÍ≤Ć ÍįĖŽäźŽÉźžóź ŽĒįŽĚľ, Žč§Ž•ł žā¨ŽěĆžóźÍ≤Ć žĖľŽßąŽāė žĘčžĚÄ žėĀŪĖ•žĚĄ ž§Ą žąė žěąŽäĒžßÄ ŽäźÍĽīÍįÄÍ≥† žěąŽč§.
‚ÄúÍŅąžĚĄ Í峎©ī žė® žöįž£ľÍįÄ ŽĄąŽ•ľ žßÄžßÄŪēīž§Ą ÍĪįžēľ.‚ÄĚ ‚ÄėŽ¨īž≤≠‚Äô žĄ†žÉĚŽčėŽď§ÍĽė Žäė Žď£Žćė ŽßźžĚīŽč§. žĚī ŽßźžĚÄ Žäė ŽāėžóźÍ≤Ć žúĄŽ°úÍįÄ ŽźėžĖīž£ľžóąŽćė ŽßźžĚīŽč§. žĘĀžĚÄ Í≥®Ž™© ŽĀ̞󟎏Ą ŪĎłŽ•ł ŪēėŽäėžĚÄ žĖłž†úŽāė Í≥ĶŪŹČŪēėÍ≤Ć Ūéľž≥źž†ł žěąžóąŽč§. ž°įÍłą ÍĪįžįĹŪē†žßÄ Ž™®Ž•īžßÄŽßĆ, Í∑łŽ†áÍ≤Ć Í≥ĶŪŹČŪēėÍ≤Ć žė® žĄłžÉĀžĚī ŪŹČŪôĒŽ°úžõĆžßą ÍŅąžĚĄ ÍŅĒŽ≥łŽč§.

žĚīž†ú žč§ž†úžĚė ‚ÄėÍįúŽĮłŽßąžĚĄ‚ÄôžĚÄ žó≠žā¨ žÜćžúľŽ°ú žā¨ŽĚľž°ĆŽč§. 2005ŽÖĄŽ∂ÄŪĄį Ž≤ēž°įŪÉÄžöī ŽďĪžĚī ž°įžĄĪŽź† žėąž†ēžúľŽ°ú ž≤†ÍĪįŽ•ľ ŪēúŽč§ŽäĒ Í≥ĶÍ≥†Ž•ľ ŪēėŽč§,
žĖľŽßą ž†Ą žôĄž†ĄŪěą Íįēž†ú ž≤†ÍĪįŽ•ľ ŪēīŽ≤ĄŽ¶į Í≤ÉžĚīŽč§. ŪēėžßÄŽßĆ žöįŽ¶¨Žď§ ŽßąžĚĆžÜćžóź ‚ÄėÍįúŽĮłŽßąžĚĄ‚ÄôžóźžĄú Žįįžöī žā¨ŽěĎžĚÄ žėĀžõźŪē† Í≤ÉžĚīŽ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