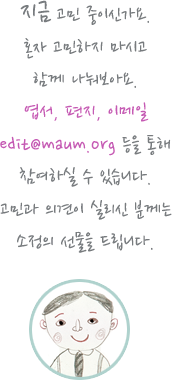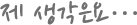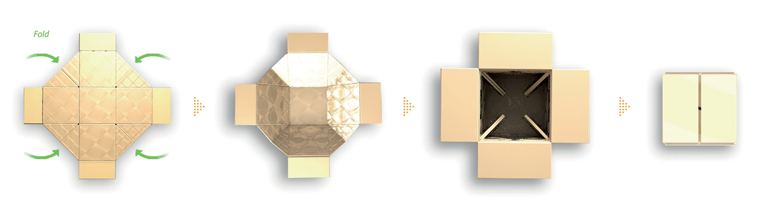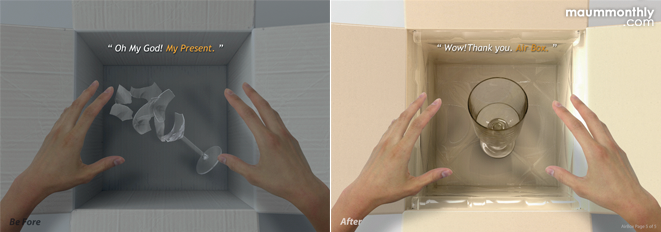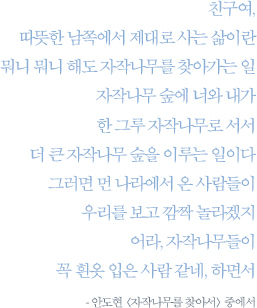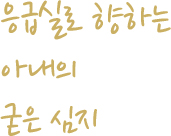
글 백일성

점심때가 지나고 열도 좀 내리고 좋아지는가 싶었는데 급기야 화장실에서 앞이 노래지는 현상을 느끼고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에 사다코가 되어 화장실을 기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하는 병원인데 자기 입으로 가자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 정말 급했나 봅니다. 부랴부랴 지갑과 차 키를 챙겨서 아내를 부축하고 서둘러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잠시 저의 행동을 제지합니다. 그리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한마디 합니다.
“아… 자기야… 아… 좀… 씻고… 아….” 그리고 다시 화장실로 기어 들어갑니다. 이런, 잠시 후 나온 아내를 다시 부축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아내가 제 손을 힘없이 뿌리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아… 아… 자기야… 속옷 좀… 속옷 좀… 갈아입고… 아….” 이런, 주섬주섬 속옷을 찾아서 건네주니 이제 얼굴까지 하얗게 질린 아내가 웅얼거립니다. “아… 아… 자기야… 그… 색깔 말고… 보라색… 보라색 꽃무늬… 아….”

이런… 씨, 속옷까지 갈아입히고 나가려는데 제 손을 또 잡습니다.
“또 왜?” “아… 자기야… 이 옷 땀에 젖어서… 안 돼… 옷 갈아입고… 아….”
옷장에서 트레이닝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물끄러미 보더니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청바지를 집었습니다. 다시 고개를 젓습니다. 검정 레깅스를 집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윗도리는 아내가 베이지색 후드티를 직접 지목해서 빨리 찾았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히고 아내를 다시 부축하는데 아내의 눈빛이 떨립니다. “뭐? 또? 뭐?”
“아… 아… 자기야… 그래도… 양치는 하고 가자… 아….” 이런, 망고씨…. 헛구역질을 하면서도 꼼꼼히 어금니까지 양치질을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혓바닥을 닦다 기어코 변기통을 부여잡습니다. 부축을 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멱살을 잡고 나온 건지 하여간 아내를 데리고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에도 아내는 현관문 안에 대고 웅얼거립니다. “아… 송이야… 아… 저녁 챙겨 먹고… 저기 냉동실에… 아… 돈까스….” 할 수 없이 목덜미를 잡아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장염 판정을 받고 응급실에서 3시간 동안 수액 두 병, 주사 한 대, 해열제 한 통을 맞았습니다. 아내 곁을 지키는 동안 일요일 저녁 응급실은 참 분주했습니다.
아내가 좀 살 만한지 배고프다며 일어납니다. 김치가 먹고 싶다고…. 그리고 그제야 응급실 주위를 한 바퀴 둘러봅니다. 귓속말로 한 침대 한 침대 알려주며 무슨 일로 왔는지 아내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이제는 웃음까지 되찾은 아내가 나지막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이 나는 왜 누워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까? ㅎ.”
저도 나지막이 대답해줬습니다. “다 알 거야 아마… 아까 간호사하고 나하고 얘기하는 거 들었을 거야… 당신 화장실에서 똥 싸다 쓰러졌다고 말했거든.” “이런… 레몬씨, 포도씨, 수박씨… 아저씨 둑는다~~” 동갑내기 아내의 입이 걸어진 거 보니까 다 나았나 봅니다. ㅎ


올해 마흔세 살의 백일성님은 동갑내기 아내와 중학생 남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이야기 방에 ‘나야나’라는 필명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으며, 수필집 <나야나 가족 만만세>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