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 졸업 직장인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다
허영희 43세. 성주초등학교 교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집안 환경이 넉넉하지 못하고 공부에도 관심이 없었던 나는 중학교 졸업 후 여상에 들어갔다. 졸업 후엔 바로 대기업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내가 하는 일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 일은 섬세함과 정교함이 매우 필요했다. 하지만 나는 늘 덤벙거렸고, 실수가 잦았다. 그러다 보니 매번 팀장님께 불호령이 떨어지게 혼나기 일쑤였다. 회사 생활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자신감이 바닥을 쳤다. 그럴 때마다 ‘여기서 못 하면 딴 데 가서도 똑같다’는 동료들의 말을 위로 삼으며 직장 생활을 계속했지만,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나의 실수는 회사에 큰 손실을 가져왔고, 무기력과 좌절, 괴로움, 고통스러움으로 점철된 직장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럴 때마다 좋은 잡지와 책을 보면서 내 마음을 다잡았다.
도전과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 깊이 공감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인 양 생각하며 꿈을 키웠다.
한 번 태어난 인생, 이렇게 살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 억눌렸던 생활에서 벗어나 날개를 활짝 펴보고 싶었다.
24살 되던 해 결국 나는 직장에 사표를 냈다. 집에선 시집이나 가라며 재촉했지만 대학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하고 입시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엔 학원에서 학력 평가를 할 때 최하 점수를 받았다. 영어 발음기호를 몰라 영어 단어조차 읽을 줄 몰라서 남동생한테 하나하나 물어가며 공부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힘든 직장 생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밤과 낮이 없는 3교대 근무에다 몸, 마음이 혹독한 시기였던 만큼, 무엇인가를 꿈꾸고 도전하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했기 때문이다. 어릴 적에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뒤늦게 정신을 차려서 하다 보니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고, 그만큼 매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공부를 하다가 암담해지고 슬럼프에 빠지면 공부로 그 슬럼프를 극복해갔기에 학원에서 만난 동생들은 지금도 “그때 공부 참 열심히 했던 언니”로 기억한단다.
결국 3년간의 노력 끝에 광주교대의 장학생으로 입학했을 땐 가족들도 신기해했고 나도 무척이나 기뻤다. 학교의 과 동기와 선배들은 “어떻게 그 나이에 여상을 졸업하고 교대에 올 수 있었냐”며 놀라워했다. 돌아보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덕분에 나이 차 많이 나는 선후배들과의 학교생활도 즐겁게 해나갈 수 있었다. 그때의 도전은 나로 하여금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어느덧 9년 차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사를 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서 기쁘다.
‘그 나이에 뭐하러?’ 아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현순 59세. 시민기자.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우리 세대 여자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편과 아이 뒷바라지하며, 자기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그냥 세월을 보낸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뭔가 하고 싶다는 열망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한 채 어느새 할머니가 되고 말았다.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 자기들만의 생활이 있었고, 내 가슴엔 허전함만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늦었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해보지 못했던 일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2000년, 48세 때 그렇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시작했다. 나이가 들어서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사소한 거 하나라도 메모를 하지 않으면 기억을 못 하고, 메모한 것을 수차례 거듭해서 해봐야지 그제야 반 정도는 내 것이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배운 피아노는 나에게 많은 위안을 주었다.
첫 도전에 성공하자 다른 분야에 도전할 용기가 생겼다. 50세에는 글쓰기 공부를 했다.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글로 써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2002년, 인터넷 신문에 첫 기사를 올렸다. 그냥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쓴 것인데 생각지도 않게 인기를 끌었다. 그러면서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고, 잡지사 연재, 방송 프로그램의 패널로도 출연을 했다. 갑작스런 변화에 나도 놀랄 따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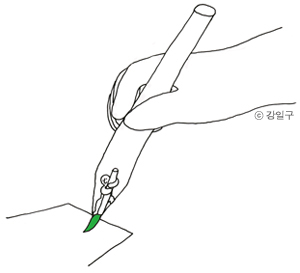
사진을 찍으며 내 주변에 있는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죽어가는 이름 모를 작은 벌레, 길가에 핀 알 수 없는 풀꽃들 모두가 아름답게 보였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 하더라도 작은 렌즈를 통해서 보는 세상은 아직 아름답고 살 만한 것이란 것도 알았다.
사진을 찍다 보니 이번엔 포토샵의 필요성을 알게 돼 53세에는 포토샵을 배웠다. 사실 강좌 내내 1/4 정도도 못 알아듣고, 못 따라했지만 그래도 시작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에서 보기만 했던 기교들을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그리고 57세 때에는 지역 신문의 시민기자가 되었다. 젊은 사람들만의 점유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기자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그렇게 도전은 도전으로 이어지고, 내 삶을 전혀 다르게 바꾸어놓았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뭔가에 처음 도전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했다. 어디를 가나 제일 나이가 많았고, ‘그 나이에 뭐하러?’ 하는 시선을 느낄 때는 좌절도 했다. ‘내가 이 나이에 주제도 모르고 시작한 것은 아닌가,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고 손자나 봐줄 걸 그랬나?’ 하면서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었다. 포기하고 싶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포기했더라면 오늘의 이 기쁨, 이 행복, 희열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글을 쓰고 사진을 찍을 때 난 내 나이를 까맣게 잊곤 한다. 사실 나이라는 게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처음 도전을 시작했던 40대 후반. 지금 그 나이의 엄마들을 보면 무엇이든지 겁 없이 배워도 좋을 나이라는 생각이 든다. 70세가 되어 지금의 내 나이를 바라보면 또 그럴 것이다. 혹 나이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내일이 오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시작하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