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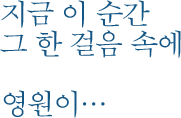
사진 & 글 이창수
K2 베이스캠프에서 바라본 달빛 1200×1800mm.
“3년, 700일 동안의 여정, 히말라야는 내게 한 걸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그 욕심이 사라지더라고요. 밤새 5,000m 설산을 넘으며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극복하니 걷는 게 달라지더군요. 많은 생각을 하다 어느 날 굉장히 가뿐하게 치고 올라갔더니 벌써 에베레스트에 와 있더군요. 그때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일 뿐이야… 한 걸음만 떼면 돼. 오래 걷다 보니 무시간성(無時間性) 시간이라는 게 느껴져요. 나 없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뭔지 어렴풋이 알게 됐고, 그게 시간성, 현재성이 주는 실재 아닐까 생각했죠. 그렇게 걷는 것에 집중하면서 다가오는 것을 한 장 한 장 담았습니다.”
‘자연’이라는 모든 것은 예외 없이 시간의 변화를 안고 간다. 그곳에서 작은 한 점 되어 걸었다. 길을 걷다 보면 앞에 있는 산이, 그 산을 감싸는 구름이, 그 구름 사이를 비집는 빛이, 꿈틀대고 넘실대는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살아 있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은 아름답지 아니한 것이 없다. 큰 기쁨이다. 너도 나도.
어느 한순간 마음으로 한 장의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비록 한 편의 일부일지라도 대상과 맞닿는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의 순간이 ‘영원한 찰나’라는 살아 있음이다. ‘사진 찍기’는 대상을 마음으로 꿰뚫어 보는 것이다. 그 순간의 진정한 마음만이 필요할 뿐이다.

얌드록초 호수 1500×4300mm. 라싸에서 시가체 가는 중간 길에 있는 얌드록초 호수. 티베트의 4대 성호 가운데 하나이다.
히말라야는 고대 인도 말인 산스크리트어로 눈(雪)을 뜻하는 ‘히마(hima)’와 사는 곳을 뜻하는 ‘알라야(alaya)’가 합쳐져 만들어진 말로 ‘눈이 있는 곳’ 또는 ‘눈의 집’을 의미한다. 이처럼 히말라야에는 1년 내내 새하얀 만년설이 덮여 있다.
시작도, 끝도 찰나.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다는 현존. 그 길을 걸었다. 높은 산, 먼 길. 살 수 있는 땅과 죽을 수 있는 땅의 경계까지. 너무 빨라 멈출 것만 같은 심장의 뜀박질과 희박한 산소를 한껏 마셔야만 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 걸음, 다시 또 한 걸음 내디뎠다. 히말라야 산중에서, 히말라야 산중을.
언제였는지도 모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묵은 눈, 빙하에 지금 눈이 내린다. 더 짙을 수 없는 푸른빛이 설산을 감싸 안아 더 투명할 수 없는 세상을 연다. 2000억 개인지, 4000억 개인지도 모를 만큼, 많은 별이 모였다는 은하의 강이 먹빛 어둠을 밝힌다. 그런 시간 속에서 얼키설키 엮여 만들어진 나의 DNA에 이 모든 것들이 내려앉는다.
한 호흡과 한 걸음에 깊이 빠질 때, 산과 내가 ‘한 존재’로 느껴지는 바로 그때, 감히 사진 한 장 찍곤 다시 걷는다. 히말라야가 품고 있는 내면의 숨결 또한 가슴 깊이 새긴다. 그런 산의 모습을 오롯이 느끼는 순간은 곧 자신의 본성을 보고 느끼는 순간이었다.

야크 카르카 캠프의 아침 운해 1200× 5800mm. 시샤팡마 베이스캠프 가기 전 야크 카르카 캠프에서 본 아침 운해.
멀리 네팔의 히말라야산맥이 운해 사이로 보인다.

팅그리 평원에서 바라본 에베레스트와 초오유 1200×4800mm. 에베레스트(초모랑마) 와 초오유에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다.
에베레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영국의 측량국장이었던 조지 에베레스트 경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사진가 이창수님은 중앙대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월간 샘이 깊은 물> <월간 중앙> 등의 사진기자를 지냈다. 2000년 경남 하동 악양에 정착하여 지리산의 속내와 사람살이를 사진에 담아 <움직이는 산, 智異> <Listen-‘숨’을 듣다> 등의 사진전을 열었다. 현재 순천대학 사진예술학과 외래교수이다. 2011년 12월부터 700여 일에 걸쳐 히말라야 설산의 내면과 사람들을 담은 히말라야 14좌 사진展 <이창수·영원한 찰나> 전시회가 오는 8월 11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에서 열린다. 히말라야 14좌는 히말라야산맥과 카라코람산맥에 걸쳐 분포하는 8,000미터급 봉우리 14개를 말한다. 히말라야는 인도 북부에서 중앙아시아 고원 남쪽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산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