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ёҖ м„ұнҳ„мҳҘ
вҖҳмҷ„мЈј л¬ёнҷ”мқҳ 집вҖҷ мҡҙмҳҒмһҗ

лӮҳмқҳ кі н–ҘмқҖ м „л¶Ғ мҷ„мЈјкө° кІҪмІңл©ҙ мҡ©ліөл§Ҳмқ„мқҙлӢӨ. мІңл…„ мӮ¬м°° нҷ”м•”мӮ¬ м–ҙк·Җм—җ мң„м№ҳн•ң көӯлҸ„ ліҖ л§Ҳмқ„, м–ҙлҰ° мӢңм Ҳ мҡ°лҰ¬ л§Ҳмқ„мқҖ 집집л§ҲлӢӨ мқёмӮјкіј к°җ лҶҚмӮ¬лҘј м§Җм—Ҳкі мқёк·ј л§Ҳмқ„ мӨ‘ к°ҖмһҘ н’ҚмЎұн•ҳкі м •мқҙ л„ҳм№ҳлҚҳ л§Ҳмқ„лЎң кё°м–өн•ңлӢӨ. 집집л§ҲлӢӨ н”јм–ҙ мһҲлҠ” мұ„мҶЎнҷ”, лҙүмҲӯм•„, л§Ёл“ңлқјлҜё, мӘҪл‘җлҰ¬кҪғл“ӨмқҖ лӮҙ м–ҙлҰ° л§ҲмқҢмқ„ н’Қмҡ”лЎӯкІҢ н•ҙмЈјм—ҲлӢӨ.
к·ёлҹ° кі н–Ҙмқ„ л– лӮҳ лҸ„мӢңм—җм„ң н•ҷкөҗлҘј лӢӨлӢҲкі мЎём—…н•ҳкі кІ°нҳјлҸ„ н–ҲлӢӨ. к·ёлҰ¬кі л¬ёнҷ” мҳҲмҲ 분야 мқјмқ„ н•ҳл©° лӢӨмӢң м°ҫмқҖ лӮҙ кі н–Ҙ. к·ё мӮ¬мқҙ кі н–ҘмқҖ л„Ҳл¬ҙ лӢ¬лқјм ё мһҲм—ҲлӢӨ. 100м—¬ к°Җкө¬мҳҖлҚҳ л§Ҳмқ„мқҖ 40к°Җкө¬лЎң мӨ„м–ҙ мһҲм—Ҳкі , кҪғмқҙ мҶҢлӢҙн•ҳкІҢ н”јм–ҙ мһҲлҚҳ л§ҲлӢ№кіј нқҷкёёмқҖ мӢңл©ҳнҠёмҷҖ м•„мҠӨнҢ”нҠёлЎң нҸ¬мһҘлҗҳм–ҙ мһҲм—ҲлӢӨ. к·ё л§ҺлҚҳ кҪғл“ӨмқҖ лӢӨ м–ҙл””лЎң к°”мқ„к№Ң. кҪғм”ЁлҘј лӮҳлҲ„м–ҙмЈјмӢңлҚҳ л§ҲлӢ№ л„“мқҖ 집 н• лЁёлӢҲк°Җ к·ёлҰ¬мӣҢмЎҢлӢӨ. мҳӣлӮ м—җлҠ” л¶ҖмһЈм§‘мқҙм—ҲмқҢмқ„ м—ҝліҙкІҢ н•ҳлҠ” лҶ’мқҖ лӢҙмһҘл“ӨмқҖ нқүл¬јмқҙ лҗҳм–ҙ к°ҖмҠҙмқ„ лӢөлӢөн•ҳкІҢ л§Ңл“ лӢӨ. вҖңм№ңкө¬л“Өкіј лҸҷл„Ө м–ёлӢҲ мҳӨл№ , мӮјмҙҢл“ӨмқҖ лӢӨ м–ҙл””м—җвҖҰ?вҖқ
мқҙмһҘм§Ғмқ„ л§Ўмңјм…ЁлҚҳ м№ңн•ң м№ңкө¬ м•„лІ„лӢҳк»ҳ мҳӣ мқҙм•јкё°лҘј лқ„мҡ°л©° вҖңлҸҷл„Өм—җ мғқкё° л„ҳм№ҳлҠ” мқј н•ңлІҲ н•ҙліјк№Ңмҡ”?вҖқ н•ҳлӢҲ вҖңмқҙм ң лӯҗ м–ҙл–»кІҢ н•ҙліј мҲҳ мһҲкІ м–ҙ, лӢӨл“Ө лӮҳмқҙк°Җ л“Өм–ҙм„ңвҖҰвҖқ н•ҳл©° л§җлҒқмқ„ нқҗлҰ¬м…ЁлӢӨ. к·ёлҹ¬лӢӨ 2007л…„, к·јл¬ҙн•ҳлҚҳ л¬ёнҷ”мқҳ 집 нҳ‘нҡҢмқҳ кіөлӘЁ мӮ¬м—…мқҙ мһҲм—ҲлӢӨ. л¶ҖмЎұн•ҳм§Җл§Ң л§Ҳмқ„ мқҙм•јкё°лҘј лӢҙм•„ лӮҳмқҙ л“ м•„лІ„м§Җмқҳ л’·лӘЁмҠө к°ҷмқҖ кіЁлӘ©м—җ кҪғм”ЁлҘј лҝҢлҰҙ мҲҳ мһҲлҠ” н”„лЎңк·ёлһЁмқ„ л§Ңл“Өкё° мӢңмһ‘н–ҲлӢӨ. нҡҢмқҳм Ғмқё л°ҳмқ‘мқ„ ліҙмқҙлҠ” м–ҙлҘҙмӢ л“Өк»ҳ мһ‘кІҢлқјлҸ„ мӢңмһ‘н•ҙ ліҙмһҗл©° м„Өл“қн–Ҳкі , 비мҠ·н•ң мӮ¬лЎҖлЎң м„ұкіөмқ„ кұ°л‘” лӢӨлҘё м§Җм—ӯмқ„ кІ¬н•ҷн•ҳмӢ м–ҙлҘҙмӢ л“Өмқҳ мғқк°ҒлҸ„ мЎ°кёҲм”© л°”лҖҢм—ҲлӢ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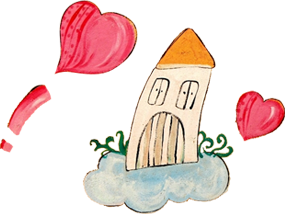
к·ёл ҮкІҢ 2007л…„ 7мӣ”л¶Җн„° 5к°ңмӣ”к°„мқҳ вҖҳл§Ҳмқ„ кҫёлҜёкё°вҖҷ н”„лЎңм қнҠёк°Җ мӢңмһ‘лҗҳм—ҲлӢӨ.
л§Ҳмқ„ кө¬м„қкө¬м„қ л°©м№ҳлҸј мһҲлҚҳ м“°л Ҳкё°лҘј м№ҳмҡ°кі , мҚ©мқҖ мқҙлҒјк°Җ л¶ҷмқҖ лӢҙлІјлқҪлҸ„ к№ЁлҒ—мқҙ н„ём–ҙлғҲлӢӨ. мІӯмҶҢл§Ң н–ҲлҠ”лҚ°лҸ„ л§Ҳмқ„мқҖ нҷҳн•ҙм§ҖлҠ” кІғ к°ҷм•ҳлӢӨ. м–ҙлҘҙмӢ л“Өкіј көҗнҡҢ мІӯл…„л¶Җмқҳ лҸ„мӣҖмңјлЎң нҺҳмқёнҠёлҸ„ м№ н•ҳкі лҸҢмқ„ мЈјмӣҢлӢӨ кёёк°Җмқҳ лӮҳл¬ҙ нҷ”лӢЁлҸ„ л‘ҳлҹ¬мЈјкі , л¬ёнҷ”мқҳ 집 лҜёмҲ к°•мӮ¬л“Өкіј м•„мқҙл“Ө, лҸҷнҳёнҡҢ нҡҢмӣҗл“Өмқҳ л§ҲмқҢмқҙ лӘЁм•„м§Җкё° мӢңмһ‘н–ҲлӢӨ. лҶ’мқҖ кіЁлӘ© лӢҙл“Өм—җлҠ” лҸҷнҷ” мҶҚмқҳ к·ёлҰјл“Өмқҙ к·ёл ӨмЎҢлӢӨ.
вҖңм•„мқҙл“Өмқҳ мЎ°мһҳкұ°лҰјкіј мӣғмқҢмҶҢлҰ¬к°Җ л“ӨлҰ¬лҠ” кІғ к°ҷм•„мҡ”вҖқлқјл©° мқёк·ј көҗнҡҢ мӮ¬лӘЁлӢҳмқҖ мҡ”мғҲлҠ” м•„мқҙмҷҖ н•Ёк»ҳ л§Өмқј лҸҷл„Ө н•ң л°”нҖҙлҘј лҸҢкі мқҙм•јкё° лӮҳлҲҲлӢӨкі н•ҳкі , вҖҳмҡ°лҰ¬к°Җ лӯҳ н•ҳкІ м–ҙ?вҖҷ н•ҳл©° л©ҖлҰ¬м„ң л°”лқјліҙлҚҳ м–ҙлҘҙмӢ л“ӨлҸ„ м җм°Ё лӢӨк°ҖмҳӨкё° мӢңмһ‘н–ҲлӢӨ. мһ‘м—…н•ҳлҠ” мқҙл“Өм—җкІҢ мғҲм°ёмқ„ к°Җм ёлӢӨмЈјл©° мӢ лӮҳкІҢ л§Ҳмқ„ мқҙм•јкё°лҘј л“Өл ӨмЈјмӢ лӢӨ.
вҖңмҳӣлӮ м—” м—¬кё° мҡ°л¬јмқҙ мһҲм—ҲлҠ”л””, 집집л§ҲлӢӨ л¬ј кёёлҹ¬ м—¬кё°лЎң лӢӨ лӘЁмҳҖлӢ№к»ҳ.вҖқ вҖңмҡ°лҰ¬ мҡ©ліөл§Ҳмқ„мқҙ ліөмқҙ л“Өм–ҙмҳӨлҠ” л§Ҳмқ„мқҙм—¬, мқҙлҰ„ м•Ҳм—җ мҡ©мқҙ лҲ„мӣҢ мһҲлӢӨкі лҸ„ н•ҳкі вҖҰ.вҖқ
м–ҙлҘҙмӢ л“Өмқҳ мҳӣмқҙм•јкё°к°Җ кёёмқҙ лҗҳм–ҙ, мҡ°л¬јмқҙ мһҲлҚҳ к·ё мһҗлҰ¬м—” мҡ°л¬јмқ„ к·ёлҰ¬кі , мҳӨлһҳлҗң л°©м•—к°„м—” л°©м•„ м°§лҠ” нҶ лҒј к°„нҢҗмқҙ кұёл ёлӢӨ.

н•ң н•ҙк°Җ м§ҖлӮң лҙ„мқҙм—ҲлӢӨ. көӯлҸ„ ліҖ л§Ҳмқ„ нҡҢкҙҖ мһ…кө¬м—җ кҪғл“Өмқҙ л§Ңл°ңн–ҲлӢӨ.
вҖңл©ҙм—җм„ң н•ҙмЈјм—Ҳм–ҙмҡ”?вҖқлқјкі 묻мһҗ вҖңм•„л…Җ, м–ём ң н–ҲлҠ”к°Җ лӘЁлҘҙкІҢ мқҳмӮ¬н• лЁёлӢҲк°Җ л§Ңл“Өм—Ҳм–ҙвҖқ н•ҳлҠ” л§җм—җ к№ңм§қ лҶҖлһҖ м Ғмқҙ мһҲм—ҲлӢӨ. л§Ҳмқ„ нҡҢкҙҖ м•һ집м—җ нҷҖлЎң мӮ¬мӢңлҠ” нҢ”мҲң л„ҳмңјмӢ н• лЁёлӢҲмқҳ мҶңм”ЁмҳҖлӢӨ. нһҳл“Өм§Җ м•Ҡм•ҳлғҗлҠ” л¬јмқҢм—җ вҖңлҶҚмӮ¬лҸ„ м•Ҳ 징кІҢ мӮҙмӮҙ л§Ңл“Өм—Ҳм§ҖвҖҰ.вҖқ
м°Ёл“Өмқҙ мҢ©мҢ© лӢ¬лҰ¬лҠ” көӯлҸ„ лҸ„лЎңк°Җм—җ кҪғл°ӯмқ„ л§Ңл“Өкё° мң„н•ҙ м§ҖнҢЎмқҙлҘј м§ҡкі л…ёкө¬лҘј мқҙлҒ„мӢңл©° мҷ”лӢӨ к°”лӢӨ н•ҳм…Ёмқ„ кұё мғқк°Ғн•ҳлӢҲ л§ҲмқҢмқҙ лЁ№лЁ№н•ҙмЎҢлӢӨ.

мІҳмқҢ мӢ¬м—ҲлҚҳ кҪғл“Өмқҙ лӢӨ м§Җмһҗ н• лЁёлӢҲлҠ” лӢӨмӢң к°Җмқ„м—җ н”јлҠ” кіјкҪғлӮҳл¬ҙлҘј мӢ¬мңјм…ЁлӢӨ. к·ёлҹ°лҚ° к°Җмқ„мқҙ лҗҳмһҗ көӯлҸ„ ліҖмқ„ мҳӨк°ҖлҠ” м°Ёлҹүл“Ө, м°ЁлҘј л©Ҳм¶”кі кҪғ л”°к°ҖлҠ” мҶҗлҶҖлҰјмқҙ мӢ лӮҳм…ЁлӢӨ. вҖҳм•„лӢҲ, м Җкұё н• лЁёлӢҲк°Җ м–ҙл–»кІҢ мӢ¬мңјмӢ кұҙлҚ°вҖҰ.вҖҷ лӮҳлҠ” мҶҚмғҒн–Ҳм§Җл§Ң н• лЁёлӢҲлҠ” мҳӨнһҲл Ө нқҗлӯҮн•ҳкІҢ л°”лқјліҙм…ЁлӢӨ.
мқҙмҷём—җлҸ„ нқҗлӯҮн–ҲлҚҳ мқјмқҖ мҡ°лҰ¬ лҸҷл„Ө мҲҳнҳёмӢ к°ҷмқҖ м •мһҗлӮҳл¬ҙ мқҙм•јкё°лӢӨ. м•„л¬ҙлҰ¬ лҚ”мҡҙ лӮ лҸ„ к·ё лӮҳл¬ҙ м•„лһҳм—җ лҲ„мҡ°л©ҙ м„ёмғҒ л¶Җлҹ¬мҡё кІҢ м—ҶлҚҳ м •мһҗлӮҳл¬ҙ мқҙнҢҢлҰ¬к°Җ л§җлқјк°Җл©° м җм җ нһҳмқ„ мһғкі мһҲм—ҲлӢӨ. лӘЁл‘җ мҶҚмғҒн•ң л§ҲмқҢл§Ң мһҲмқ„ лҝҗ ліҙнҳёмҲҳлЎң м§Җм •лҗң лӮҳл¬ҙмқҙлӢҲ н•Ёл¶ҖлЎң мҶҗлҢҲ мҲҳлҸ„ м—Ҷкі лӮҳл¬ҙлҘј лҚ®кі мһҲлҠ” мҪҳнҒ¬лҰ¬нҠёлҘј ліҙм•„лҸ„ н•ңл‘җ н‘јмқҳ мҳҲмӮ°мңјлЎңлҠ” м–ҙм°Ң н•ҙліј м—¬л Ҙмқҙ м•Ҳ лҗҳлҠ” мғҒнҷ©мқҙм—ҲлӢӨ. к·ёлҹ¬лҚҳ мӨ‘ л§Ҳмқ„ мҲңнҡҢлҘј н•ҳлҚҳ кө°мҲҳлӢҳмқҙ, мқҙмҒң л§Ҳмқ„ л§Ңл“ӨкІ лӢӨкі лҚ”мҡҙ лӮ л•Җ нқҳлҰ¬лҠ” мЈјлҜјл“Өмқҙ мқҙкө¬лҸҷм„ұмңјлЎң мҡ”мІӯн•ҳлҠ” лӮҳл¬ҙ мӮҙлҰ¬кё°м—җ к°җнғ„н•ҙ н•ҙкІ°н• мҲҳ мһҲлҠ” кёёмқ„ н„° мЈјм…ЁлӢӨ.

л§Ҳмқ„мқҳ м—ӯмӮ¬мқҙмһҗ мғҒ징мқё м •мһҗлӮҳл¬ҙк°Җ мӮҙм•„лӮҳм„ңмқјк№Ң. к·ё нӣ„ мҡ°лҰ¬ л§Ҳмқ„м—” мғқк°Ғм§ҖлҸ„ лӘ»н•ң мқјл“Өмқҙ мғқкё°кё° мӢңмһ‘н–ҲлӢӨ. мҳӨк°ҖлҚҳ мӮ¬лһҢл“Өмқҙ мҳҲмҒң л§Ҳмқ„мқҙлқјл©° мӮ¬м§„ м°Қм–ҙ лё”лЎңк·ём—җ мҳ¬лҰ¬л©ҙм„ң м җм°Ё мҶҢл¬ёмқҙ лӮҳкё° мӢңмһ‘н•ң кІғмқҙлӢӨ. мқјл¶Җлҹ¬ м°ҫм•„мҳӨлҠ” мӮ¬лһҢлҸ„ мғқкІјкі , л§Ҳмқ„ 분л“ӨмқҖ вҖҳмҡ°лҰ¬ 집мқ„ м°Қм–ҙк°”лӢӨвҖҷл©° көүмһҘнһҲ лҝҢл“Ҝн•ҙн•ҳм…ЁлӢӨ. м–ҙлҠҗ лӮ нҸ¬н„ёмӮ¬мқҙнҠё кІҖмғү мҲңмң„ 2мң„м—җ мһҲлҠ” кұё ліҙкі лӮҳ м—ӯмӢң лҶҖлһҖ м Ғмқҙ мһҲлӢӨ.
вҖңм»ҙн“Ён„°м—җлҸ„ лӮҳмҳӨкі мң лӘ…н•ҙмЎҢлҠ”л”” м–ҙм°Ң 기분мқҙ м•Ҳ мўӢмқ„ мҲҳ мһҲлҢң. мҳӣлӮ м—җлҠ” міҗлӢӨлҸ„ м•Ҳ ліҙлҚҳ мҡ°лҰ¬ 집кө¬м„қлҸ„ мқҙмҒҳлӢӨкі н•ӯкІҢ мһҗкҫё мІӯмҶҢлҸ„ н•ҳкі вҖҰ мқјмқҖ л§Һм•„мЎҢм–ҙлҸ„ мўӢлӢ№кІҢ.вҖқ
2008л…„ мҡ©ліөл§Ҳмқ„мқҖ лҶҚлҰјл¶Җ вҖҳмҳҲмҒң л§Ҳмқ„ мҪҳн…ҢмҠӨнҠёвҖҷм—җм„ң мҡ°мҲҳмғҒмқ„ л°ӣм•ҳлӢӨ. мһҳ к·ёлҰ° к·ёлҰјмқҙм–ҙм„ңк°Җ м•„лӢҲкі лҸҷл„Ө мЈјлҜјл“Өмқҳ м• м •мқҙ лӢҙкёҙ кө¬м„қкө¬м„қ мқҙм•јкё°к°Җ мўӢм•ҳлӢӨкі н•ңлӢӨ.
2009л…„м—җлҠ” мҷ„мЈјкө°м—җм„ң м§Җмӣҗн•ң вҖҳм°ё мӮҙкё° мўӢмқҖ л§Ҳмқ„ л§Ңл“Өкё° мӮ¬м—…вҖҷм—җ м„ м •лҗҳм–ҙ л§Ҳмқ„ кіөлҸҷ мӮ¬м—…мһҘмқё л‘җл¶Җ кіөмһҘмқҙ л“Өм–ҙм„ңкІҢ лҗҳм—ҲлӢӨ. 집집л§ҲлӢӨ мҪ© лҶҚмӮ¬лҘј н•ҳкі лӮЁмқҖ мҪ©мқ„ нҷңмҡ©н•ҙ л§Ҳмқ„ кіөлҸҷ мӮ¬м—…мңјлЎң л°ңм „мӢңмјң лӮҳк°Җкі мһҲлҠ” кІғмқҙлӢӨ. вҖҳмҡ°лҰ¬ лҸҷл„Ө л‘җл¶Җ м°ё л§ӣмһҲлӢӨкі лӮңлҰ¬м—¬вҖҰвҖҷ мһҗлһ‘мқ„ лҠҳм–ҙлҶ“лҠ” м–ҙлЁёлӢҳл“Өмқҳ н–үліөмқ„ м–ҙм°Ң л§җлЎң н‘ңнҳ„н• к№Ң.
мҡ”мғҲ м–ҙлҘҙмӢ л“ӨмқҖ м»ҙн“Ён„°лҘј л°°мҡ°лҹ¬ лӢӨлӢҢлӢӨ. вҖңл§Ҳмқ„ мқј н•ҳлӢӨ ліёк»ҳ л°°мӣҢм•јкІ лҚ”лқјкі вҖҰ к·ё м°ём—җ мҶҗмһҗл“Өмқҙлһ‘ л©”мқјлҸ„ мЈјкі л°ӣкі , мғҲлҒј лӮң к°•м•„м§Җ мӮ¬м§„ м°Қм–ҙм„ң ліҙлӮҙмЈјл©ҙ лӮңлҰ¬м—¬, мўӢм•„м„ңвҖҰ.вҖқ
ліөмқҙ л“Өм–ҙмҳӨлҠ” кіі, мҡ©ліөл§Ҳмқ„. н•ңлҸҷм•Ҳ мһғм—ҲлҚҳ м ң мқҙлҰ„мқ„ м°ҫмқҖ кұёк№Ң. м–ҙлҰҙ м Ғ кё°м–өмқ„ н’Қмҡ”лЎӯкІҢ н•ҙмЈјлҚҳ лӮҳмқҳ кі н–Ҙ, м–ём ңк№Ңм§ҖлӮҳ м–ҙлҘҙмӢ л“Өмқҳ н–үліөн•ң мӮ¶мқҳ н„°к°Җ лҗҳкёё л°”лқјліёлӢ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