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žĖīŽäźŽćß žóįŽßź, Ž≤ƞ殎∂ÄŪĄį ŽŹôÍłį ŽŹôžįĹŽ∂ÄŪĄį ŽĻĄž¶ąŽčąžä§ ÍīÄŽ†® Ž™®žěĄÍĻĆžßÄ Žč§žĖĎŪēú žÜ°ŽÖĄŪöĆ Ž™®žěĄ žä§žľÄž§ĄžĚī žě°ŪěąÍ≥† žěąžúľžč†ÍįÄžöĒ. Ūēú ŪēīŽ•ľ žěė Ž≥īŽÉąŽäĒžßÄ ž†ēŽßź Í∂ĀÍłąŪēėÍ≥† Ž≥īÍ≥† žč∂žĚÄ žā¨ŽěĆŽď§Í≥ľžĚė Ž™®žěĄžĚī žěąŽäĒÍįÄ ŪēėŽ©ī, žô†žßÄ žĖīžÉČŪēėÍ≥† Ž∂ąŪéłŪēú Ž™®žěĄŽŹĄ žěąžĚĄ Í≤ĀŽčąŽč§. žĚłÍįĄÍīÄÍ≥ĄŽ•ľ žěė žú†žßÄŪēėÍłį žúĄŪēī žąėŽßéžĚÄ Ž™®žěĄžóź žįłžĄĚŪēėŽäźŽĚľ žßÄžĻú ž†ĀžĚī žěąžúľžčúŽč§Ž©ī, žĖīŽäź žąúÍįĄ žįłžĄĚŪēėÍłį Ž∂ÄŽčīžä§Žü¨žõƞߥ Ž™®žěĄžĚī žěąžóąŽč§Ž©ī, ŪēúŽ≤ą ž†źÍ≤ÄŪēīŽ≥ľ ŪēĄžöĒÍįÄ žěąžßÄ žēäžĚĄÍĻĆ žč∂žäĶŽčąŽč§. ŽāėŽäĒ žôú žĚī Ž™®žěĄžóź ŽāėÍįÄŽäĒÍįÄ, žôú žĚī žā¨ŽěĆŽď§Í≥ľ ŽßĆŽāėŽäĒÍįÄ. ŽāėŽäĒ žĖīŽĖ§ Ž™®žěĄžóź ÍįÄÍ≥† žč∂žĚÄÍįÄ. žßÄÍłą žßöžĖīŽī֎蹎č§.
– ŪéłžßĎžěź ž£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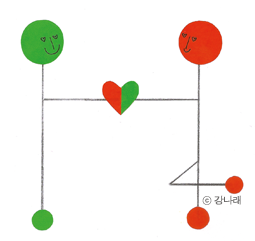
Ž™®Žď† žĚłÍįĄÍīÄÍ≥ĄŽäĒ ÍĻäžĚī žĚīŪēīŽźėÍ≥† ž≤īŪóėŽźėÍłįŽ•ľ žõźŪēúŽč§. Ž™®Žď† žĚłÍįĄÍīÄÍ≥ĄžóźžĄú ŽĻöžĖīžßÄŽäĒ ÍįąŽďĪžĚÄ žöįŽ¶¨ žěźžč†žĚĄ žĻėžú†ŪēėŽĚľŽäĒ Í≤ÉžúľŽ°ú žĚīŪēīŽźėžĖīžēľ ŪēúŽč§.– žóźŽįĒ ŽßąŽ¶¨žēĄ ž∂ĒžĖīŪėłŽ•īžä§Ūäł
– ÍĻÄÍłįŽā®. <žĄúŽ•ł, žĚłŽß•žĚī ŪēĄžöĒŪē† ŽēĆ>(žßÄžčĚÍ≥ĶÍįĄ) ž§ĎžóźžĄú
žā¨ŽěĆžĚī žāīžēĄÍįÄŽ©īžĄú žßĄž†ēŪēú žĚłÍįĄÍīÄÍ≥ĄŽ•ľ ŽßļÍłį žúĄŪēīžĄúŽäĒ ÍīÄÍ≥ĄŽ•ľ ŽßļžĚĄ ŽŅźŽßĆ žēĄŽčąŽĚľ ÍīÄÍ≥ĄŽ•ľ ŽĀäŽäĒ Žä•Ž†•ŽŹĄ žěąžĖīžēľ ŪēúŽč§. – žóėŽĻą Ū܆ŪĒĆŽü¨
žĚłÍįĄžĚÄ ž†ÄŽßąŽč§ žč†žĚė žēĄŽď§žĚīŽĮÄŽ°ú Ž™®Žď† žĚłÍįĄžĚī ž§ĎžöĒŪēėŽč§ŽäĒ žā¨žč§žĚĄ žěäžßÄ žēäŽäĒŽč§Ž©ī žěźžóįžä§ŽüĹÍ≤Ć žĘčžĚÄ žĚłÍįĄÍīÄÍ≥ĄŽ•ľ žú†žßÄŪē† žąė žěąžĚĄ Í≤ÉžĚīŽč§. – Ū󮎶¨ žĻīžĚīž†Ä
Ž™®Žď† žā¨ŽěĆÍ≥ľ žĻúÍĶ¨ÍįÄ ŽźėŽ†§ŽäĒ žā¨ŽěĆžĚÄ ŽąĄÍĶ¨žĚė žĻúÍĶ¨ŽŹĄ Žź† žąė žóÜŽč§. – ŪĒĄŪéėŪćľ

žßĄž†ēŪēú žĚėŽĮłžóźžĄú žā¨ŪöĆž†ĀžĚł ÍīÄÍ≥ĄŽ•ľ ŽßļžĚĄ žąė žěąŽäĒ žąęžěź, 150Ž™Ö
žėĀÍĶ≠žĚė Ž¨łŪôĒžĚłŽ•ėŪēôžěź Ž°úŽĻą ŽćėŽįĒ(žė•žä§Ū澎ďúŽĆÄ ÍĶźžąė)ŽäĒ 1990ŽÖĄŽĆÄ žīą, žĻ®ŪƨžßÄ, žõźžą≠žĚī ŽďĪ žėĀžě•Ž•ė 30žó¨ žĘÖžĚė žā¨ÍĶźžĄĪžĚĄ žóįÍĶ¨ŪēėŽč§ÍįÄ ŽĆÄŽáĆžĚė žč†ŪĒľžßąžĚī ŪĀīžąėŽ°Ě ÍĶźŽ•ėŪēėŽäĒ ‚ÄėžĻúÍĶ¨‚ÄôÍįÄ ŽßéŽč§ŽäĒ žā¨žč§žĚĄ žēĆžēĄŽÉąŽč§. žč†ŪĒľžßąžĚÄ ŽĆÄŽáĆ ŽįėÍĶ¨(ŚćäÁźÉ)žĚė ŪĎúŽ©īžĚĄ ŽćģÍ≥† žěąŽäĒ žłĶžúľŽ°ú ŪēôžäĶ, Íįźž†ē, žĚėžßÄ, žßÄÍįĀ ŽďĪ Í≥†ŽďĪŪēú ž†ēžč† žěĎžö©žĚĄ ÍīÄŽ¶¨ŪēėŽäĒ žėĀžó≠žĚīŽč§. žĚłÍįĄžĚė Í≤Ĺžöį žč†ŪĒľžßą ŪĀ¨ÍłįŽ•ľ ÍįźžēąŪē† ŽēĆ žĻúŽ∂Ą ÍīÄÍ≥ĄŽ•ľ žú†žßÄŪē† žąė žěąŽäĒ žā¨ŽěĆ žąėŽäĒ žēĹ 150Ž™ÖžĚīŽĚľŽäĒ Í≤É. žēĄž£ľ žā¨ÍĶźž†ĀžĚł žā¨ŽěĆžĚīŽĚľŽŹĄ žė®ž†ĄŪēú žĻúŽ∂Ą ÍīÄÍ≥ĄŽ•ľ žú†žßÄŪē† žąė žěąŽäĒ ŪēúÍ≥ĄŽäĒ 150Ž™ÖžĚīŽĚľŽäĒ žĖėÍłįŽč§.
žč§ž†úŽ°ú ŽćėŽįĒ ÍĶźžąėŽäĒ žĚīŽ•ľ žÜĆžÖúŽĄ§ŪäłžõĆŪĀ¨Ž•ľ ŪÜĶŪēú žė®ŽĚľžĚłžÉĀžĚė ‚ÄėžĻúÍĶ¨ ŽßļÍłį‚Äôžóź ž†Āžö©Ūēī Ž≥īžēėŽäĒŽćį, ŪéėžĚīžä§Ž∂Ā ŽďĪ žā¨žĚīŪ䳞󟞥ú ÍīÄŽ¶¨ŪēėŽäĒ žĚłŽß•žĚī žąėž≤ú Ž™Öžóź žĚīŽ•īŽäĒ ‚Äėžā¨ÍĶźž†ĀžĚł žā¨ŽěĆ‚ÄôÍ≥ľ Ž™á ŽįĪ Ž™Ö ž†ēŽŹĄžĚł ‚ÄėŽ≥īŪÜĶ žā¨ŽěĆ‚ÄôžĚĄ ŽĻĄÍĶźŪĖąžĚĄ ŽēĆ(žĻúÍĶ¨žĚė Íłįž§ÄžĚÄ 1ŽÖĄžóź Ūēú Ž≤ą žĚīžÉĀ žóįŽĚĹŪēėÍĪįŽāė žēąŽ∂ÄŽ•ľ Ž¨ĽŽäĒ Í≤ÉžúľŽ°ú žāľžēėŽč§.) ŽĎź Ž∂ÄŽ•ė ÍįĄžĚė žßĄž†ēŪēú žĻúÍĶ¨žĚė žąėŽäĒ Ž≥Ą žį®žĚīÍįÄ žóÜŽäĒ Í≤ÉžúľŽ°ú ŽāėŪÉÄŽā¨Žč§.
Í≤įÍĶ≠ žĻúÍĶ¨ÍįÄ 1,500Ž™ÖžĮ§ ŽźúŽč§ŽäĒ žā¨ŽěƎ吏ĚīŽāė žąėŽßĆ Ž™Öžóź Žč¨ŪēúŽč§ŽäĒ žā¨ŽěƎ硫ŹĄ, žč§ž†úŽ°úŽäĒ 150žó¨ Ž™ÖÍ≥ľŽßĆ ÍłīŽįÄŪēú ÍīÄÍ≥ĄŽ•ľ žú†žßÄŪēėÍ≥† žěąŽäĒ Í≤ÉžĚīŽč§.
MITžĚė žā¨ŪöĆŪēôžěź žÖįŽ¶¨ ŪĄįŪĀīžĚÄ žĚłŪĄįŽĄ∑žĚĄ ŪÜĶŪēú ÍįÄžÉĀ Í≤ĹŪóėžĚī žĚľŽįėŪôĒŽźėŽ©īžĄú ŽāėŪÉÄŽāėŽäĒ žěźžēĄžĚė Ž≥ÄŪôĒžóź ž£ľŽ™©ŪēīžôĒŽč§. Í∑łŽäĒ žąėŽįĪ Ž™ÖžĚė ž†äžĚÄžĚīŽď§Í≥ľ Ž∂ÄŽ™®Ž•ľ ŽĆÄžÉĀžúľŽ°ú žÉąŽ°úžöī Žß§ž≤īÍįÄ žĚīŽď§žóźÍ≤Ć ŽĮłžĻėŽäĒ žėĀŪĖ•žĚĄ žóįÍĶ¨ŪĖąŽč§. ŽÜÄŽěćÍ≤ĆŽŹĄ žĚī žóįÍĶ¨žóźžĄú ž†äžĚÄžĚīŽď§žĚī Ž∂ÄŽ™®žôÄ žĻúÍĶ¨Žď§žĚė ŽßĆžĄĪž†ĀžĚł ž£ľžĚėŽ†• Ž∂Ąžāįžóź ŽĆÄŪēī Ž∂ąŽßƞ̥ Ū܆Ž°úŪēúŽč§ŽäĒ žā¨žč§žĚī ŽďúŽü¨Žā¨Žč§. ÍįÄÍĻĆžöī žā¨ŽěĆŽď§Í≥ľ žßĎž§ĎŪēīžĄú ŽĆÄŪôĒŪēėÍ≥† žÜĆŪÜĶŪēėŽäĒ Í≤ÉžĚī žĚīž†† žē†žć® ŽÖłŽ†•ŪēīžēľŽßĆ ŪēėŽäĒ žĚľžĚī Žźú žÖąžĚīŽč§.
žĚīž†ú žöįŽ¶¨ŽäĒ ŽćĒ žĚīžÉĀ Ūēú žā¨ŽěĆÍ≥ľ žė® ŽßąžĚƞ̥ Žč§Ūēī ŽėźŽäĒ ž£ľžĚė žßĎž§ĎŪēīžĄú ŽßĆŽāėžßÄ žēäŽäĒŽč§. žßÄÍłą žĖīŽäź ŪēúÍ≥≥žóź Ž®łŽ¨ľŽü¨ žěąžßÄŽßĆ Í≥ߎįĒŽ°ú Žč§Ž•ł Í≥≥žúľŽ°ú, ž¶Č Žč§Ž•ł žĻúÍĶ¨Žāė ÍįÄž°Ī, žā¨Ž¨īžč§ ŽďĪžúľŽ°ú žėģÍ≤®ÍįĄŽč§. Í∑łŽ¶¨Í≥† žĚīŽ©ĒžĚľžĚīŽāė ŪéėžĚīžä§Ž∂ĀžĚĄ ŪÜĶŪēī Žč§Ž•ł ŽĆÄŽ•ôÍ≥ľŽŹĄ žóįÍ≤įŽźėŽäĒ žā∂žĚĄ žāįŽč§. žöįŽ¶¨ŽäĒ Ūēú Ž≤ąžóź ŽĄ§ žā¨ŽěĆžĚīŽāė žó¨Žćü žā¨ŽěĆ, ŪėĻžĚÄ Í∑ł žĚīžÉĀžĚĄ ŽßĆŽā† žąė žěąŽč§ŽäĒ Í≤Éžóź ŽßĆž°ĪŪēīŪēúŽč§. žč¨žßÄžĖī ÍĪīžĄĪžĚīŽĚľŽŹĄ ŽßĆŽā† žąė žěąŽč§Í≥† žÉĚÍįĀŪēúŽč§. Í∑łŽü¨Žč§ Ž≥īŽčą Ūēú žā¨ŽěĆŪēėÍ≥†ŽßĆ ž£ľžĚėŽ•ľ žßĎž§ĎŪēī ŽßĆŽāėŽäĒ Í≤ÉžĚÄ žė§Ū칎†§ žā¨žĻėžä§Žü¨žöī žĚľžĚī ŽźėžóąÍ≥†, ŪÉĞ̳žóź ŽĆÄŪēú ž£ľžĚė žßĎž§ĎŽŹĄŽäĒ žēĹŪēīž°ĆŽč§.
– ŽįĒžä§ žĻīžä§Ūäł. <žĄ†ŪÉĚžĚė ž°įÍĪī>(ŪēúÍĶ≠Í≤Ĺž†úžč†Ž¨łžā¨) ž§ĎžóźžĄú
žĚłÍįĄÍīÄÍ≥ĄŽŹĄ ŽĄďÍ≤Ć Ž≥īŽ©ī Ž¨ľÍĪīžĚĄ ž†ēŽ¶¨ŪēėŽäĒ Í≤ÉÍ≥ľ ÍįôžĚÄ Í≤įŽč®Ž†•žĚĄ ŪÜĶŪēī Žč®žąúŪēėÍ≤Ć ŽßƎ吏Ėīžēľ ŪēúŽč§. ŽāėžĚīŽ•ľ Ž®ĻŽč§ Ž≥īŽ©ī ŽĻĄž¶ąŽčąžä§ ÍīÄÍ≥ĄŽŹĄ žēĄŽčąŽ©īžĄú žßĄžč¨žĚĄ Í≥Ķžú†ŪēėŽäĒ Í≤ÉŽŹĄ žēĄŽčĆ žā¨ŽěĆžĚī ž£ľŽ≥Äžóź žěąŽäĒ Í≤ɞ̥ ŽįúÍ≤¨Ūē† ŽēĆÍįÄ žěąŽč§. Ž¨łž†úŽäĒ Í∑łŽď§žĚī Žč®žąúŪěą ž°īžě¨ŪēėŽäĒ Í≤Ć žēĄŽčąŽĚľ Ž∂Äž†ēž†ĀžĚł ž™ĹžúľŽ°ú Žāī žā∂žĚĄ Ūúėž†ÄžúľŽ©īžĄú žā∂žĚĄ Ž≥Ķžě°ŪēėÍ≤Ć ŽßĆŽď§ ŽēĆÍįÄ žĘÖžĘÖ žěąŽč§ŽäĒ Í≤ÉžĚīŽč§.
Í∑łŽüī ŽēĆ ‚Äúžā¨ŽěĆžĚÄ ŽßéžĚī žēĆžąėŽ°Ě žĘčžĚÄ ÍĪį žēĄŽčąÍ≤†žĖī? ž†Ä žā¨ŽěĆžĚī žĖłž†ú žĖīŽäź ŽēĆ ŽŹĄžõÄžĚī Žź†žßÄ žĖīŽĖĽÍ≤Ć žēĆžēĄ?‚ÄĚŽĚľŽäĒ žÉĚÍįĀžóź Í≥ĄžÜć ŽāīŽ≤ĄŽ†§ŽĎĒŽč§Ž©ī žā∂žĚÄ Í≤įžĹĒ Žč®žąúŪēīžßÄžßÄ žēäŽäĒŽč§. Í≥Āžóź žěąŽäĒ žĚėŽŹĄÍįÄ žąúžąėŪēėžßÄ žēäžĚÄ Í∑łŽď§žĚī žÉĚžÉČŽāīÍłįÍįÄ žēĄŽčĆ žßĄžßú ŽŹĄžõĞ̥ ž§Ą Ž¶¨ÍįÄ žóܞ̥ ŽŅźŽćĒŽü¨, ŪėĻ ŽŹĄžõĞ̥ ŽįõŽäĒŽč§Í≥† ŪēėŽćĒŽĚľŽŹĄ Í∑łŽď§žĚĄ ÍįźŽāīŪēėŽ©į ŽįõŽäĒ žĚłžÉĚžĚė žÜźžč§žĚĄ Ž≥īž†ĄŪē† ŽßĆŪĀľ ÍįÄžĻė žěąžĚĄ žąėŽäĒ žóÜŽč§. Í∑łŽüį žĚīŽď§žĚī ž£ľŽ≥Äžóź žěąŽč§Ž©ī, žĄ† ŽįĖžúľŽ°ú ž†ēž§ĎŪēėÍ≤Ć ŽįÄžĖīŽāľ žąė žěąžĖīžēľ ŪēúŽč§.
– Žā®žĚłžąô. <žĄúŽ•łžóź ÍĹÉŪĒľŽč§>(žĚīŽěĎ) ž§ĎžóźžĄú
žóįŽßź Ž™®žěĄ, žĚīŽ†áÍ≤Ć ŪēīŽ≥īŽ©ī žĖīŽĖ®ÍĻĆžöĒ?
žóįŽßźžĚÄ Ž™®žěĄžĚī ŽßéžĚÄ žčúž¶ĆžĚīŽč§. ŽįĒžĀėÍ≤Ć žāīžēĄÍįÄŽäĒ ŪėĄŽĆĞ̳Žď§žĚī Ūēú ŪēīŽ•ľ ŽßąÍįźŪēėÍ≥†, žÉąŽ°úžöī žčúžěĎžóź žē장ú žó¨Žü¨ žĚłžóįÍ≥ľžĚė Ž™®žěĄžĚĄ ŪÜĶŪēī Ūēú ŪēīŽ•ľ ž†ēŽ¶¨ŪēėÍ≥† žēąŽ∂ÄŽ•ľ ŪôēžĚłŪēėÍ≤Ć ŽźúŽč§.
ŪēėžßÄŽßĆ žĚīŽüį Ž™®žěĄŽď§žĚī Ūē≠žÉĀ ŽįėÍįÄžöī ÍĪī žēĄŽčąŽč§. ŽāīÍ≤ź ‚ÄėŽŹôžįĹ Ž™®žěĄ‚ÄôžĚī Í∑łŽě¨Žč§. Í≥†ŽďĪŪēôÍĶźŽ•ľ ž°łžóÖŪēėÍ≥† 15ŽÖĄ ž†ēŽŹĄ ŽźėŽćė ŽēĆ, žöįžóįŪěą žĻúÍĶ¨Ž°úŽ∂ÄŪĄį ŽŹôžįĹ Ž™®žěĄ žóįŽĚŞ̥ ŽįõÍ≥† Ž¨īž≤ôžĚīŽāė žĄ§Žćė ÍłįžĖĶžĚī žēĄžßĀŽŹĄ žÉĚžÉĚŪēėŽč§. Ūē®ÍĽė žěźžú®ŪēôžäĶžĚĄ Žē°Žē°žĚīžĻėŽćė žĻúÍĶ¨Ž∂ÄŪĄį ž†ĄÍĶź 1ŽďĪ ŪēėŽćė ŽÖÄžĄĚÍĻĆžßÄ, žĖīŽĖĽÍ≤Ć Ž≥ÄŪĖąÍ≥† žěė žāīÍ≥† žěąŽäĒžßÄžóź ŽĆÄŪēú Í∂ĀÍłąŪē®žúľŽ°ú Ž™®žěĄ Žā†žĚĄ ÍłįŽč§Ž†łŽč§.
ŽďúŽĒĒžĖī ŽŹôžįŎ吏Ěė ž≤ę Ž™®žěĄžĚī žóīŽ†łŽč§. ŽĄąŽ¨īŽāė žė§ŽěúŽßĆžóź Ž≥ł žĻúÍĶ¨Žď§, žĄłžõĒžĚė ŪĚźŽ¶Ąžóź ŽĒįŽĚľ Ž≥ÄŪēú Ž™®žäĶžóź žč†ÍłįŪēīŪēėŽ©į žĄúŽ°úžĚė žēąŽ∂ÄŽ•ľ Ž¨ĽÍ≥† žĖľžčłžēąŽćė ÍłįžĖĶŽď§. žā¨žóÖ žč§ŪĆ®Ž°ú ŪěėŽď§žóąŽćė žĻúÍĶ¨, žā¨Í≥†Ž°ú ž†äžĚÄ ŽāėžĚīžóź žÉ̞̥ Žč¨Ž¶¨Ūēú žĻúÍĶ¨Žď§žĚė žÜĆžčĚÍĻĆžßĂĶ. ŪēėžßÄŽßĆ Í∑łŽ†áÍ≤Ć Ž™®žěĄžĚĄ ŽĀĚŽāīÍ≥† Žč§žĚĆ Ž™®žěĄžĚī žóīŽ¶įŽč§Í≥† žóįŽĚĹžĚī žôĒžĚĄ ŽēĆŽäĒ ž≤ėžĚĆž≤ėŽüľ ŽįėÍįĎžßÄÍįÄ žēäžēėŽč§.
Ūēú Ūēī ŽĎź Ūēī Ž™®žěĄžĚĄ Ūē†žąėŽ°Ě Ž∂ÄŽčīžúľŽ°ú Žč§ÍįÄžôĒÍ≥†, žĄúŽ°ú Žč§Ž•īÍ≤Ć žāīžēĄžė® ŪôėÍ≤ĹžúľŽ°ú žĚłŪēī žĻúÍĶ¨Žď§Í≥ľžĚė ŽĆÄŪôĒžóźŽŹĄ Í≥ĶÍįźžĚī žĖīŽ†§žõ†Žč§. Í∑ł ŪõĄ ŽŹôžįĹ Ž™®žěĄžĚÄ ŽįėŽ≥ĶŽźú žėõŽā† žĖėÍłįžôÄ žěźÍłį žěźŽěĎŪēėŽäĒ Ž™®žěĄžĚī ŽźėžĖīÍįĒŽč§. ŪēúŽĎėžĒ© Ž™®žěĄžóź Žāėžė§žßÄ žēäŽäĒ žĻúÍĶ¨Žď§ŽŹĄ ŽäėžĖīŽā¨Í≥†, žßĀžóÖžĚīŽāė Í≤Ĺž†úŽ†•žĚī ŽĻĄžä∑Ūēú žĻúÍĶ¨Žď§ŽßĆžĚė žěĎžĚÄ Ž™®žěĄŽď§žĚī ŪôúžĄĪŪôĒŽźėžóąŽč§. žč¨žßÄžĖī Í≤Ĺž†úž†ĀžúľŽ°ú žĖīŽ†ĶÍĪįŽāė žěźŽěϞ̥ ŪēėÍłįžóźŽäĒ žĘÄ Ž∂Äž°ĪŪēú ‚ÄėŪŹČŽ≤ĒŪēú‚Äô žĻúÍĶ¨Žď§žĚÄ ŽŹôžįĹ Ž™®žěĄžĚī žčęŽč§Í≥† Ūē† ž†ēŽŹĄžėÄŽč§.
Í∑ł Ž¨īŽ†Ķ, ŽāėŽäĒ ŽŹôžįŎ吏óźÍ≤Ć ž†úžēąžĚĄ ŪĖąŽč§. ‚ÄúžēĄŽ¨ī žĚīŪēīÍīÄÍ≥Ą žóÜžĚī ŽßĆŽāú žĻúÍĶ¨ŽĚľžĄú ŽŹôžįĹ Ž™®žěĄžĚī žĘčÍ≥†, Ž™®ŽĎź ŪéłŪēėÍ≥† ÍłįžĀėžěźÍ≥† ŽßĆŽāėŽäĒ ÍĪīŽćį, Í∑łŽ†ážßÄ žēäŽč§Ž©ī Ž¨īžä® žĚėŽĮłÍįÄ žěąÍ≤†Žčą. žēěžúľŽ°† žą†ŽßĆ Ž®ĻžßÄ ŽßźÍ≥†, 1žčúÍįĄ ž†ēŽŹĄŽäĒ 2~3Ž™Ö ŽŹôžįŎ吏Ěī žěźžč†žĚī žāīžēĄžė® žĚīžēľÍłį, ŪēėŽäĒ žĚľ ŽďĪžĚĄ ŽįúŪĎúŪēėŽäĒ Žį©žčĚžúľŽ°ú ‚ÄėžÜĆŪÜĶ‚ÄôŪēėŽäĒ žčúÍįĄžĚĄ ÍįĖžěź‚ÄĚÍ≥†. ŪäĻŪěą Žāėžė§ÍłįŽ•ľ ÍļľŽ†§ŪēėŽäĒ ŽŹôžįĹ(ŪŹČŽ≤ĒŪēīžĄú žěźŽěĎÍĪįŽ¶¨ÍįÄ ŽßéžßÄ žēäžĚÄ)Žď§žóźÍ≤Ć ‚ÄėžěĎžĚÄ Íįēžóį‚ÄôžĚĄ ŪēėÍ≤Ć ŪēėžěźŽäĒ Žāīžö©žĚīžóąŽč§. 40ŽĆÄ ž§ĎŽįėžĚīŽč§ Ž≥īŽčą žĚīžēľÍĻÉÍĪįŽ¶¨ŽäĒ Ž¨īÍ∂ĀŽ¨īžßĄŪĖąŽč§. žĻúÍĶ¨Žď§žĚė žĚīžēľÍłįŽ•ľ Žď£Í≥† Í≥ĶÍįźŪēėŽ©īžĄú žöįŽ¶¨ŽäĒ ž†źžį® žÜĆŪÜĶŪēėÍ≥† žĄúŽ°úžĚė Ž≤ĄŪĆÄŽ™©žĚī ŽźėžĖīž£ľŽäĒ žöįž†ēžúľŽ°ú Žįúž†ĄŪēėÍ≥† žěąŽč§.
Ž™®žěĄžĚī ŽßéžĚÄ žóįŽßź, ÍĶ¨žĄĪžõźŽď§žĚĄ žĚīŪēīŪēėÍ≥† Ūē®ÍĽė Í≥ĶÍįźŪē† žąė žěąŽäĒ Ž™®žěĄžĚĄ Í≥ĄŪöćŪēīŽ≥īŽ©ī žĖīŽĖ®ÍĻĆ? žĖīŽĖ§ Ž™®žěĄžĚīŽď† Ž¨īžóážĚłÍįÄŽ•ľ žĖĽÍ≥†, žĄúŽ°ú Í≥ĶÍįźžĚė ŽĀąžĚī žěąžĖīžēľ žßÄžÜ掟† žąė žěąŽč§. žĚłÍįĄÍīÄÍ≥ĄžĚė ÍłįŽ≥łžĚÄ ‚ÄėÍīĞ訂Äô ‚ÄėÍ≥ĶÍįź‚Äô ‚ÄėŽįįŽ†§‚ÄôžĚīÍłį ŽēĆŽ¨łžĚīŽč§. – Ūôćžö©ž§Ä. 44žĄł. ŽüįžĖīžä§žĽ®žĄ§ŪĆÖ ŽĆÄŪĎ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