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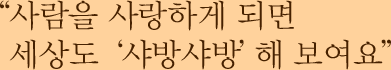
ž∑®žě¨ Ž¨łžßĄž†ē
ÍįÄŽ≠ĄÍ≥ľ žßąŽ≥ĎžúľŽ°ú Í≥†ŪÜĶŽįõŽäĒ ŽēÖ žēĄŪĒĄŽ¶¨žĻī ŪÉĄžěźŽčąžēĄ. žĚīÍ≥≥ žā¨ŽěƎ吏Ěī ÍįÄžě• ŪēĄžöĒŽ°ú ŪēėŽäĒ Í≤É ž§Ď ŪēėŽāėÍįÄ ŽįĒŽ°ú Ž¨ľžě֎蹎č§. žĶúÍ∑ľžóĒ ÍįÄŽ≠ĄžúľŽ°ú žĚłŪēī žÉĀŪô©žĚī ŽćĒ ŽāėŽĻ†ž°ĆžäĶŽčąŽč§. žčúÍ≥®žóźžĄúŽäĒ 20Ž∂ĄžĒ© ÍĪłžĖīÍįÄžĄú Ž¨ľžĚĄ ÍłłŽü¨žė§ÍĪįŽāė, ŽŹôŽ¨ľŽď§žĚī žĄúžčĚŪēėŽäĒ žóįŽ™Ľ Ž¨ľŽ°ú žĄ§ÍĪįžßÄ, ŽĻ®Žěė, žčĚžąėŽ°ú žā¨žö©ŪēėŽč§ÍįÄ ÍłįžÉĚž∂©Í≥ľ ž†ĄžóľŽ≥ĎžúľŽ°ú Ž™©žą®žĚĄ žěÉŽäĒ Í≤ĹžöįŽŹĄ ŽßéžäĶŽčąŽč§.
ŽĆÄŪēôžóźžĄú žēĄŪĒĄŽ¶¨žĻīžĖīŽ•ľ ž†ĄÍ≥ĶŪēú ÍĻÄžö©Í≤ĹžĒ®ŽäĒ 2008ŽÖĄ ÍĶźŪôėŪēôžÉĚ ŪĒĄŽ°úÍ∑łŽě®žĚĄ žĚīžąėŪēėÍłį žúĄŪēī ŪÉĄžěźŽčąžēĄžóź žôĒžäĶŽčąŽč§. ž≤ėžĚĆžóźŽäĒ Í∑łž†Ä ‚Äė1ŽÖĄ žěė Ž≥īŽāīŽč§ ÍįÄžěź‚ÄôŽäĒ žÉĚÍįĀžĚīžóąžßÄŽßĆ ŪėĄžßÄ žā¨ŽěĆŽď§Í≥ľ Ūē®ÍĽėŪēú Ž™á ÍįúžõĒ ŽŹôžēą Í∑łŽäĒ žĚłžÉĚžĚė ŪĀį ž†ĄŪôėž†źžĚĄ ŽßěžĚīŪēėÍ≤Ć Žź©ŽčąŽč§.
‚ÄúžĚīÍ≥≥ žā¨ŽěƎ吏ĚÄ ŽāėžĀú ž™ĹžĚĄ ŽįĒŽĚľŽ≥īžßÄ žēäžēĄžöĒ. Ž∂Äž°ĪŪēīŽŹĄ Ūē≠žÉĀ ž¶źÍ≤ĀÍ≤Ć žāīŽćĒŽĚľÍ≥†žöĒ. ž†ÄŽď§Ž≥īŽč§ Ūõ®žĒ¨ ŽćĒ Ūíćž°ĪŪēú ŽāėŽäĒ žôú žĚīŽ†áÍ≤Ć Ž∂ąŽßĆžĚī ŽßéÍ≥† Ūē≠žÉĀ Ž≠ĒÍįÄžóź žęďÍłįŽ©į žāīžēėžĚĄÍĻĆ. žĚī žā¨ŽěĆŽď§Í≥ľ ŪŹČžÉĚ Ūē®ÍĽėŪēėÍ≥† žč∂Žč§ŽäĒ ŽßąžĚĆžĚī ÍįĄž†ąŪēīž°ĆžĖīžöĒ.‚ÄĚ
žö©Í≤ĹžĒ®ŽäĒ ÍłłÍĪįŽ¶¨žóźžĄú, žčúžě•žóźžĄú, Í∑łŽď§Í≥ľ Ž∂ÄŽĆÄŽĀľŽ©į žĻúÍĶ¨ÍįÄ ŽźėžĖīÍįĒžäĶŽčąŽč§. ž†źž†ź ŪėĄžßĞ̳Žď§ Ūēú žā¨ŽěĆ Ūēú žā¨ŽěĆžĚī žÜĆž§ĎŪēėÍ≥† žā¨ŽěϞ䧎üĹÍ≤Ć Ž≥īžĚīÍłį žčúžěĎŪĖąÍ≥†, žěźžč†žóźÍ≤Ć žÉąŽ°úžöī ÍŅąžĚĄ žč¨žĖīž§Ä ŪÉĄžěźŽčąžēĄžóź Ž¨īžóážúľŽ°úŽď† Ž≥īŽčĶŪēėÍ≥† žč∂žóąžäĶŽčąŽč§.
Í∑łŽ¶¨Í≥† 2009ŽÖĄ, ŪėĄžßĞ̳ žĻúÍĶ¨ žēĆŽ†Čžä§(31)žĚė ž†úžēąžúľŽ°ú ž§ĎÍ≥† žĚėŽ•ė ŽďĪžĚĄ žąėž∂úŪēėŽäĒ žā¨žó̥֞ žčúžěĎŪēėŽ©į Ūēú ÍįÄžßÄ Í≤įžč¨žĚĄ ŪĖąžäĶŽčąŽč§. žĚīŽč§žĚĆžóź ŽŹąžĚĄ ŽßéžĚī Ž≤ĆÍ≤Ć ŽźėŽ©ī žĚīÍ≥≥ žā¨ŽěƎ吏̥ žúĄŪēī žöįŽ¨ľžĚĄ ŪĆĆÍ≤†Žč§ŽäĒ Í≤ÉžĚīžóąžßÄžöĒ. ŪēėžßÄŽßĆ ŽŹôžóÖžěź žēĆŽ†Čžä§žĚė žÉĚÍįĀžĚÄ Žč¨ŽěźžäĶŽčąŽč§.
‚Äú‚ÄėŽŹąžĚĄ Ž≤ĆÍ≤Ć ŽźėŽ©ī‚ÄôžĚī žēĄŽčąŽĚľ žßÄÍłą ŽčĻžě• žěąŽäĒ ŽŹąžúľŽ°ú Ūē®ÍĽė žöįŽ¨ľžĚĄ ŪĆĆžěź. žė§ŽäėžĚī ŽßąžßÄŽßČ Žā†žĚł Í≤Éž≤ėŽüľ žóīžč¨Ūěą žāīžěź.‚ÄĚ
ŽĎėžĚÄ Í≥ߎįĒŽ°ú žēĆŽ†Čžä§žĚė Í≥†ŪĖ•žĚł Masasi(Žßąžā¨žčú)ŽĚľŽäĒ ŽßąžĚĄžóź ž≤ę Ž≤ąžßł žöįŽ¨ľžĚĄ ŽßĆŽď§ÍłįŽ°ú Ūē©ŽčąŽč§. Žč§Ž•ł Žč®ž≤īžĚė ŽŹĄžõÄ žóÜžĚī ŽāĮžĄ† ŽāėŽĚľžĚė ŪēúŽ≥ĶŪĆźžóź žöįŽ¨ľžĚĄ ŪĆźŽč§ŽäĒ Í≤ÉžĚÄ žČ¨žöī žĚľžĚÄ žēĄŽčąžóąžäĶŽčąŽč§. žöįŽ¨ľ ŪĆĒ ŽŹą 700žó¨ ŽßĆ žõźžĚĄ ŪėĄžßÄ žóÖžěźžóźÍ≤Ć Í≥†žä§ŽěÄŪěą žā¨ÍłįŽčĻŪēėÍłįŽŹĄ ŪĖąžßÄžöĒ. žč§ŽßĚžĚī žĽłŽćė žö©Í≤ĹžĒ®žóźÍ≤Ć žēĆŽ†Čžä§ŽäĒ ŪĀį ŪěėžĚī ŽźėžóąžäĶŽčąŽč§.
‚ÄúŽŹąžĚÄ ŽćĒ Ž≤ĆŽ©ī ŽźėŽčąÍĻĆ Í∑ł žĚľ ŽēĆŽ¨łžóź žā¨Žěƞ̥ ŽĮłžõĆŪēėŽäĒ ŽßąžĚƞ̥ ÍįĖžßÄ Žßźžěź. žöįŽ¶¨ÍįÄ žěÉžĖīŽ≤ĄŽ¶į ŽŹąžĚÄ ŪēėŽäėžóź ž†Äž∂ēŪēú ÍĪįžēľ. ŪēėŽāėŽčėžĚÄ Í∑ł ŽßąžĚƞ̥ Žč§ žēĄžč§ ŪÖĆŽčąÍĻĆ.‚ÄĚ
2010ŽÖĄ žó¨Ž¶Ą, žöįžó¨Í≥°ž†ą ŽĀĚžóź ŽßƎ吏ĖīžßĄ žöįŽ¨ľ. žąėŽįĪ Ž™ÖžĚė ŽßąžĚĄ žā¨ŽěƎ吏Ěī Ž™®ŽĎź Ž™®žó¨ žÜĆŽŹĄ žě°Í≥† ž∂§žĚĄ ž∂ĒŽ©į žěĒžĻėŽ•ľ žóīžóąžäĶŽčąŽč§. ŽēĆŽ°úŽäĒ ŪĀį žÜźŪēīŽ•ľ Ž≥īÍłįŽŹĄ ŪēėÍ≥†, ŽßźŽĚľŽ¶¨žēĄŽ°ú Ž©įžĻ†žĒ© žēďžēĄŽąēÍłįŽŹĄ ŪēėŽ©īžĄúŽŹĄ ŪėĄžßÄžôÄ ŪēúÍĶ≠žĚĄ žė§ÍįÄŽ©į 3ŽÖĄÍįĄ žā¨žó̥֞ Í≥ĄžÜćŪēīžė§Í≥† žěąŽäĒ ÍĻÄžö©Í≤ĹžĒ®. žĚīŽüį ŪĀ¨Í≥† žěĎžĚÄ Í≥†žÉ̞̥ ‚ÄėžąėžóÖŽ£Ć‚Äô žāľžēĄ ‚ÄėžĖīŽ†§žõÄ žÜćžóźžĄúŽŹĄ ž¶źÍ≤ĀÍ≤Ć žā¨ŽäĒ Ž≤ē, žā¨Žěƞ̥ žĄ¨ÍłįŽäĒ Ž≤ē‚ÄôžĚĄ ŽįįžöīŽč§Í≥† ŽßźŪē©ŽčąŽč§. Í∑łŽ¶¨Í≥† ¬†Í∑łŽď§žóźÍ≤Ć Žįįžöī Žāôž≤úž†ĀžĚł ŽßąžĚĆžúľŽ°ú žĄł Ž≤ąžßł žöįŽ¨ľžĚĄ ž§ÄŽĻĄŪēėÍ≥† žěąžäĶŽčąŽč§.
‚Äúžā¨ŽěƎ吏̥ žā¨ŽěĎŪēėŽäĒ Í≤Ć Ž®ľž†ÄžĚł ÍĪį ÍįôžēĄžöĒ. Í∑łŽü¨Ž©ī žĄłžÉĀžĚī ‚ÄėžÉ§Žį©žÉ§Žį©‚ÄôŪēī Ž≥īžĚīÍ≥†, ž†Ä žěźžč†ŽŹĄ žä§žä§Ž°ú ŽįĒŽÄĆŽćĒŽĚľÍ≥†žöĒ. žßÄÍłąžĚÄ žöįŽ¨ľ ŪĆĆŽäĒ ÍĪłŽ°ú žčúžěĎŪĖąžßÄŽßĆ Žāėž§ĎžóźŽäĒ ŪēôÍĶźŽŹĄ žßďÍ≥† ŽŹĄžĄúÍīÄŽŹĄ ŽßĆŽď§Í≥† žč∂žĖīžöĒ.‚ÄĚ




ÍĻÄžö©Í≤ĹŽčėžĚÄ 2008ŽÖĄ ÍĶźŪôėŪēôžÉĚžúľŽ°ú ŪÉĄžěźŽčąžēĄŽ•ľ Žį©Ž¨łŪēėŽ©īžĄú ŪėĄžßĞ̳Žď§žĚė ͳ枆ēž†ĀžĚł žā∂žóź ÍįźŽ™ÖžĚĄ ŽįõžäĶŽčąŽč§. 2009ŽÖĄŽ∂ÄŪĄį Ž¨īžó≠ ŪöĆžā¨Ž•ľ žöīžėĀŪēėŽ©į Í∑ł žąėžĚĶÍłąžúľŽ°ú ŪÉĄžěźŽčąžēĄžĚė žčúÍ≥® ŽßąžĚĄžóź žöįŽ¨ľžĚĄ ŽßƎ吏Ėīž£ľÍ≥† žěąŽäĒ Í∑łŽäĒ žēěžúľŽ°úŽŹĄ žĄłžÉĀžóź Ų̄ŽßĚÍ≥ľ ŽŹĄžõĞ̥ ž£ľŽäĒ žā¨ŽěĆžĚī ŽźėÍ≥† žč∂Žč§Í≥† Ūē©ŽčąŽ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