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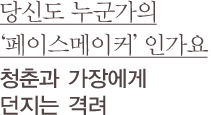
кёҖ м •лҚ•нҳ„ л¬ёнҷ”м№јлҹјлӢҲмҠӨнҠё
м–ҙлҠҗ мҡҙлҸҷнҡҢ. л¶ҖлӘЁлӢҳмқҙ м—Ҷм–ҙ м җмӢ¬лҸ„ м«„м«„ кө¶м–ҙм•ј н•ҳлҠ” нҳ•м ңм—җкІҢ лӢ¬лҰ¬кё°лһҖ м–ҙл–Ө мқҳлҜёмҳҖмқ„к№Ң. нҳ•мқҖ л°°к°Җ кі н”Ҳ лҸҷмғқмқ„ мң„н•ҙ лӢ¬лҰ°лӢӨ.
мҳӨлЎңм§Җ лӘ©н‘ңлҠ” лқјл©ҙ н•ң л°•мҠӨ. 1л“ұмқҙ м•„лӢҢ 2л“ұмқ„ н•ҙм•ј л°ӣмқ„ мҲҳ мһҲлҠ” лқјл©ҙ н•ң л°•мҠӨлҘј мң„н•ҙ нҳ•мқҖ 1л“ұмқ„ н• мҲҳ мһҲм§Җл§Ң 2л“ұмңјлЎң нҺҳмқҙмҠӨлҘј л§һм¶ҳлӢӨ. лҸҷмғқмқҖ л©ҖлҰ¬м„ң мҡ°мӮ°мңјлЎң нҳ•мқҳ нҺҳмқҙмҠӨлҘј мЎ°м Ҳн•ңлӢӨ. мҡ°мӮ°мқ„ нҺҙл©ҙ л№ЁлҰ¬ лӢ¬лҰ¬кі мҡ°мӮ°мқ„ м ‘мңјл©ҙ мІңмІңнһҲ лӢ¬лҰ¬лҠ” мӢқмқҙлӢӨ. мқҙ мһҘл©ҙмқҖ вҖҳнҺҳмқҙмҠӨл©”мқҙм»ӨвҖҷлқјлҠ” мҳҒнҷ”мқҳ мЈјм ңлҘј 압축н•ңлӢӨ. кұ°кё°м—җлҠ” кҝҲмқҙлӮҳ мқјмқҳ м„ұкіј нҳ№мқҖ мЈјм—ӯмқҙ лҗҳлҠ” кІғліҙлӢӨ лӢ№мһҘмқҳ мғқкі„лҘј мң„н•ҙ лӢ¬л Өм•ј н–ҲлҚҳ мҡ°лҰ¬ мӢңлҢҖмқҳ лӘЁл“ нҺҳмқҙмҠӨл©”мқҙм»Өл“Өмқҳ мӮ¶мқҙ лӢҙкІЁм ё мһҲлӢӨ.
мһҗмӢ мқ„ мң„н•ҙм„ңк°Җ м•„лӢҲлқј лҲ„кө°к°ҖлҘј мң„н•ҙм„ң лӢ¬лҰ¬лҠ” мЎҙмһ¬. вҖҳнҺҳмқҙмҠӨл©”мқҙм»ӨвҖҷлҠ” к·ё м ңлӘ©м—җм„ңл¶Җн„° мҡ°лҰ¬лҘј мҡём»Ҙн•ҳкІҢ л§Ңл“ лӢӨ. 30нӮ¬лЎңк№Ңм§Җ мЈјм—ӯ(?)мқҳ нҺҳмқҙмҠӨ мЎ°м Ҳмқ„ мң„н•ҙ лӢ¬лҰ¬кі лҠ” м •мһ‘ лӮЁмқҖ 12.195нӮ¬лЎңлҘј лҠҳ нҸ¬кё°н• мҲҳл°–м—җ м—ҶлҠ” мЎҙмһ¬. к·ёлһҳм„ң лҠҳ мҠӨнҸ¬нҠёлқјмқҙнҠё л’ӨнҺём—җ м„ң мһҲмқ„ мҲҳл°–м—җ м—ҶлҠ” к·ёлҰјмһҗ к°ҷмқҖ мЎҙмһ¬. мҳӨлЎңм§Җ лӘё н•ҳлӮҳм—җ мқҳм§Җн•ҙ кІ°мҠ№м җк№Ңм§Җ к°Җм•ј н•ҳлҠ”, к·ёкІғлҸ„ 1л“ұмқ„ н•ҳкё° мң„н•ҙм„ңк°Җ м•„лӢҲлқј мқјлЎңмҚЁ лӢ¬л Өм•ј н•ҳлҠ” нҺҳмқҙмҠӨл©”мқҙм»Өмқҳ л§ҲлқјнҶӨмқҖ, мҰҗкұ°мӣҖкіјлҠ” мғҒкҙҖм—Ҷмқҙ нһҳкІЁмҡҙ л…ёлҸҷмңјлЎң 집м•ҪлҗҳлҠ”, мқјлЎңм„ңмқҳ мӮ¶мқ„ кІӘм–ҙмҳЁ к°ҖмһҘл“Өмқ„ к°ҖмһҘ мһҳ н‘ңнҳ„н•ңлӢӨ. к·ёл ҮкІҢ лӢ¬лҰ¬кі лӢ¬л Ө лҸҷмғқмқ„ м„ұкіөмӢңнӮӨкі лҠ”, м •мһ‘ мһҗмӢ мқҖ л…ёлҸҷм—җ н”јнҸҗлҗң лӘёлҡұм–ҙлҰ¬ н•ҳлӮҳ лҚ©к·ёлҹ¬лӢҲ м•Ҳкі мһҲмңјл©ҙм„ңлҸ„, к·ё мһҳлҗң лҸҷмғқл§Ң ліҙл©ҙ л°”ліҙк°ҷмқҙ мӣғлҠ” к°ҖмһҘл“Ө. к·ёлҹ° нҳ•мқҙ л¶ҖлӢҙлҗңлӢӨлҠ” лҸҷмғқмқҳ л§җм—җ м§Ҳмұ…н•ҳкё°ліҙлӢӨлҠ”, мҳӨнһҲл Ө к·ёкІғлҸ„ лӘЁлҘҙкі лҸҷмғқмқ„ нһҳл“ӨкІҢ н–ҲлӢӨл©° мһҗмұ…н•ҳлҠ” к·ёлҹ° мЎҙмһ¬л“Ө. вҖҳнҺҳмқҙмҠӨл©”мқҙм»ӨвҖҷлҠ” мқҙл“Өм—җкІҢ лҚҳм§ҖлҠ” н—ҢмӮ¬ к°ҷмқҖ мҳҒнҷ”лӢӨ.

нқҘлҜёлЎңмҡҙ кұҙ мқҙ к°ҖмһҘмқ„ лҢҖліҖн•ҳлҠ” л“Ҝн•ң нҺҳмқҙмҠӨл©”мқҙм»Ө л§Ңнҳё мҳҶм—җ мқҙ мӢңлҢҖмқҳ мІӯм¶ҳмқ„ лҢҖліҖн•ҳлҠ” л“Ҝ м„ёмӣҢлҶ“мқҖ мӢ м„ёлҢҖ лҜёл…ҖмғҲ(мһҘлҢҖлҶ’мқҙлӣ°кё° м„ мҲҳ) м§Җмӣҗ(кі м•„лқј)мқҙлһҖ мЎҙмһ¬лӢӨ. вҖҳмўӢм•„н•ҳлҠ” мқјкіј мһҳн•ҳлҠ” мқјвҖҷ мӨ‘ м–ҙл–Ө кІғмқ„ м„ нғқн• кІғмқёк°Җм—җ лҢҖн•ң л§Ңнҳёмқҳ м§Ҳл¬ёмқҖ к·ёлһҳм„ң мқҙ н•ң мӢңлҢҖлҘј кІӘмқҖ к°ҖмһҘ к°ҷмқҖ мқёл¬јмқҙ мқҙ мӢңлҢҖмқҳ мІӯм¶ҳл“Өм—җкІҢ лҚҳм§ҖлҠ” нҷ”л‘җлӢӨ. вҖҳмўӢм•„н•ҳлҠ” мқјмқ„ 진мӢ¬мқ„ лӢӨн•ҙ н•ҳлӢӨ ліҙл©ҙ мһҳн•ҳкІҢ лҗңлӢӨвҖҷлҠ” мғҒнҲ¬м Ғмқј мҲҳ мһҲлҠ” мқҙм•јкё°мЎ°м°Ё, мҳЁлӘёмңјлЎң л§җн•ҳлҠ” нҺҳмқҙмҠӨл©”мқҙм»Өмқҳ мһ…мқ„ нҶөн•ҙ м „н•ҙм§Җкё° л•Ңл¬ём—җ мғҒнҲ¬м„ұмқ„ л„ҳм–ҙм„ лӢӨ.

к№ҖлӘ…лҜјмқҖ мқҙ мҳҒнҷ”к°Җ кІ°көӯ лҢҖмӮ¬ лӘҮ л§Ҳл””к°Җ м•„лӢҲлқј лӘёмңјлЎң л§җн•ҙмӨҳм•ј к·ё 진мӢ¬мқ„ м „н• мҲҳ мһҲлӢӨлҠ” кІғмқ„ м•„лҠ” л°°мҡ°мҳҖлӢӨ. мҷ„лІҪн•ҳкІҢ нҺҳмқҙмҠӨл©”мқҙм»ӨлЎң л№ҷмқҳлҗң к№ҖлӘ…лҜјмқҖ м–ҙлҲҢн•ҳкё° мқҙлҘј лҚ° м—ҶлҠ” м–јкөҙкіј 비м©Қ л§ҲлҘё мІҙкө¬, к·ёлҰ¬кі лӢ¬лҰ¬кі лӢ¬л Өм„ң л„ҲлҚңл„ҲлҚңн•ҙ진 л°ңл°”лӢҘ к°ҷмқҖ м§Җк·№нһҲ мһҗм—°мҠӨлҹҪкІҢ л“ңлҹ¬лӮҳлҠ” лӘё мһҗмІҙлЎң мқҙ 진мӢ¬мқ„ м „н•ңлӢӨ. мқҙ мҳҒнҷ”лҠ” к·ёлһҳм„ң к№ҖлӘ…лҜјмқҳ м–јкөҙкіј лӘёмқ„ л°”лқјліҙлҠ” кІғл§ҢмңјлЎңлҸ„ к·ё к°ҖмҠҙмқҙ м°Ўн•ҙм§Ҳ мҲҳл°–м—җ м—ҶлӢӨ.

л…№лЎқм§Җ м•ҠмқҖ мӮ¶ мҶҚм—җм„ң мҡ°лҰ¬лҠ” лӘЁл‘җк°Җ лӢ¬л Ө лӮҳк°„лӢӨ. лҲ„кө°к°ҖлҠ” м•һм„ңк°Җкі лҲ„кө°к°ҖлҠ” л’ӨмІҳм§Җм§Җл§Ң лҳҗ лҲ„кө°к°ҖлҠ” к·ём Җ к·ё л ҲмқҙмҠӨм—җм„ң нғҲлқҪлҗҳм§Җ м•Ҡкё° мң„н•ҙ лҲ„кө°к°Җмқҳ нҺҳмқҙмҠӨл©”мқҙм»ӨлЎң лӢ¬лҰ¬кё°лҸ„ н•ңлӢӨ. мқҙ к№ҖлӘ…лҜјмқҙлқјлҠ” лҶҖлқјмҡҙ л°°мҡ°м—җ мқҳн•ҙ мҷ„м„ұлҗң вҖҳнҺҳмқҙмҠӨл©”мқҙм»ӨвҖҷлҘј ліҙл©ҙм„ң мҡём»Ҙн–ҲлӢӨл©ҙ лӢ№мӢ мқҖ м–ҙм©Ңл©ҙ мқҙ мӮ¬нҡҢ мҶҚм—җм„ң л•Ңл•ҢлЎң нҺҳмқҙмҠӨл©”мқҙм»Өмқҳ м—ӯн• мқ„ л¶Җм§Җл¶ҲмӢқк°„м—җ н•ҙмҳЁ мһҘліёмқёмқј мҲҳ мһҲлӢӨ. к·ёкІғмқҙ м•„лӢҲлқјл©ҙ лӢ№мӢ мЈјліҖмқҳ лҲ„кө°к°Җк°Җ лӢ№мӢ мқҳ нҺҳмқҙмҠӨл©”мқҙм»ӨмҳҖлҠ”м§ҖлҸ„. к·ёлһҳм„ң вҖҳнҺҳмқҙмҠӨл©”мқҙм»ӨвҖҷлҠ” мһҗкҫёл§Ң мһҗмӢ мқ„ лҳҗ мЈјліҖмқ„ лҸҢм•„ліҙкІҢ л§Ңл“ңлҠ” мҳҒнҷ”лӢӨ.
лҲ„кө°к°Җ 1л“ұмқ„ н•ҳкё° мң„н•ҙ лӢ¬лҰҙ л•Ң, мһҗмӢ мқҖ мӮҙкё° мң„н•ҙ лӢ¬лҰҙ мҲҳл°–м—җ м—Ҷм—ҲлҚҳ к·ёл“Өм—җкІҢ
мқҙм ңлҠ” кҝҲкҝ”ліҙлқјкі м•„лӮҢм—Ҷмқҙ ліҙлӮҙлҠ” мқ‘мӣҗ.

л¬ёнҷ”м№јлҹјлӢҲмҠӨнҠё м •лҚ•нҳ„лӢҳмқҖ лҢҖмӨ‘л¬ёнҷ”нҸүлЎ к°Җ, м¶ңнҢҗ нҺём§‘мһҗ, мһ‘к°ҖлЎңлҸ„ нҷңлҸҷ мӨ‘мқҙл©°, н‘ёлҘёлҜёл””м–ҙмғҒ мӢ¬мӮ¬мң„мӣҗ, мҪ”лҰ¬м•„л“ңлқјл§ҲнҺҳмҠӨнӢ°лІҢ мӢ¬мӮ¬мң„мӣҗмқҙкё°лҸ„ н•©лӢҲлӢӨ. нҳ„мһ¬ л¬ёнҷ”비нҸү лё”лЎңк·ё лҚ”нӮӨм•ҷ(thekian.net)мқ„ мҡҙмҳҒн•ҳкі мһҲмҠөлӢҲлӢӨ.



